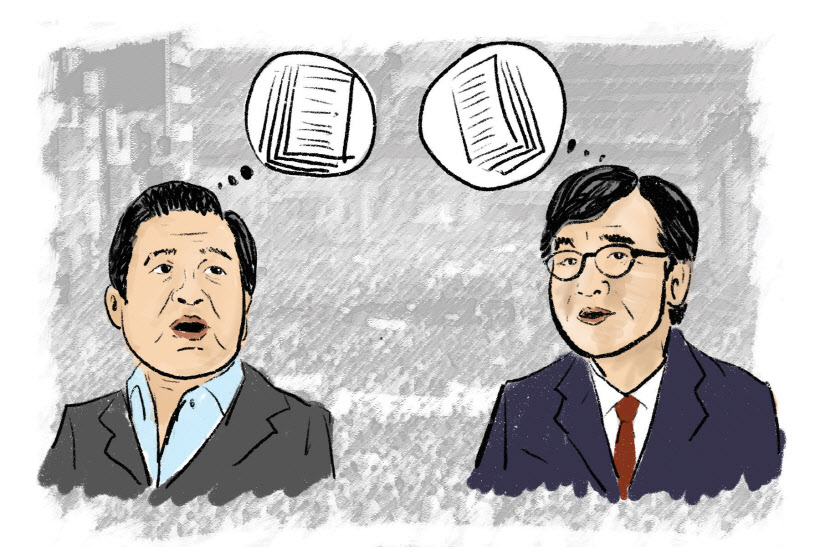
2016년 3월 이천 부악문원에서 작가 이문열을 만났을 때 그는 '변경'의 후속작으로 80년대를 정리하는 작품을 집필 중이었다. 작업의 진척을 묻는 질문에 대뜸 "골치 아프다"고 푸념했다. "뜸을 너무 오래 들였고 나는 늙어버렸다"며 "그러는 동안 역사가 왜곡된 인식으로 굳어지고 주장과 선동이 역사가 되어간다는 느낌"이라 했다. 대가의 푸념이 낯설어 "전 시대를 정리해 현 시대의 독자에게 전달하는 일은 늘 고민스럽지 않은가"라고 다시 물었다. 답변에서 고민의 핵심이 나왔다.
"기억에는 개인적 기억과 그것이 공유되는 사회적 기억, 후세에 기록될 역사적 기억이 있다"며 "그런데 기억은 변경되고 조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작품을 준비하는 10년 동안 내 주변의 사회적 기억을 확인해왔는데 굉장한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경찰과 치고 받은 젊은 취객이 장년이 되자 전두환 욕을 했다가 경찰에게 맞는 민주화 투사로 변신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무수하니 "그 시대의 사회적 기억을 어떻게 복원하고 해석하느냐가 심각한 고민"이라는 얘기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환한 80년 '서울의 봄'은 서로 다른 기억으로 처연하다. 신군부의 권력장악 시도에 학생운동권이 맞섰던 현장에서 유시민과 심재철은 동지였다. 서슬퍼런 합수부 조사실에 끌려간 이후 4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 기억은 심재철을 변절한 가해자로, 유시민을 피해자로 규정해왔다. 유시민이 당당한 피해자로 그 시절을 방송에서 유쾌하게 회고하자, 심재철은 당시의 진술서를 공개하며 유시민의 기억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일제 식민시대 이후 100여년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가해의 기억과 피해의 기억으로 분열됐다. 그러나 식민시대, 동란시대, 산업화·민주화 시대의 대혼란을 거치면서 억울하게 가해의 기억에 갇히거나 반대로 피해의 기억에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무수할 것이다. 그래서 맥락을 살피지 않고 가해와 피해를 일도양단식으로 구분하는 역사인식은 위험하다. 심재철의 때늦은 반발은 자신을 변절자로 규정한 피해자들의 기억이 역사적으로 확정될까 두려워했기 때문 아닐까 싶다.
이문열은 "한 시대는 같은 가락의 반복이 아니라 화성(和聲)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자꾸 단음으로 만들려 한다"며 "이런 것들이 계속 걸리니까 글 쓰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윤인수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