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그리워하던 아버지 얼굴
그후로 기억에서나마 만날수 있어
공광규 시인 '소주병' 뜻밖에 읽고
초라해진 나의 부친 초상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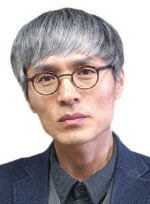
유학의 고전 '예기'에 나오는 말이다. 여기서 왜 아버지의 경우에는 '책'이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하필 '그릇'을 예로 들었는지 다소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 문제를 따지는 일은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자. 어쨌거나 이 말은 지금 곁에 없는 어떤 사람을 추억하는 데 평소 그가 애용하던 사물이 때로 긴요한 역할을 한다는 작은 진실이 담겨 있으니 말이다.
나에게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사물이 있다. 나는 중학교 시절 이후로 지금껏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한 기억이 거의 없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 서울에서 홀로 생활했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서울에 오신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쩌다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이라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올라와서 선생님을 만나곤 했고 그런 경우는 일 년에 한두 번도 되지 않았다. 그만큼 아버지는 생전에 서울 땅을 밟아본 적이 별로 없었다.
아무튼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적 진학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아버지가 서울에 왔을 때의 일이다. 둘이서 시장 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문득 아버지가 보이지 않기에 뒤돌아보았더니 아버지는 어느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 계셨다. 뭘 보시나 했더니 아버지의 눈길은 신발 가게에 진열된 커다란 고무신에 멈춰 있었다. 그리곤 혼자 말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저 고무신을 사다 드릴텐데…" 하셨다.
어촌의 농사꾼이었던 할아버지는 발이 유난히 컸다. 그 때문에 꼭 맞는 신을 구할 수 없어서 고무신 뒤축을 가위로 잘라서 신고 다니기 일쑤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장이 들어서는 날이면 큰 고무신을 찾아 돌아다니곤 했지만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이라 할아버지의 발에 맞는 고무신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날 운 좋게 "맞으면 신고 가세요!"라는 문구가 써져 있는 신발가게에서 사이즈가 큰 고무신을 구한 것이다. 그날 아버지의 밝은 표정을 나는 잊지 못한다. 그리고 서울 시장 길에서 커다란 고무신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당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얼굴 또한 잊지 못한다. 그 이후로 나는 고무신만 보면 기억에서나마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고무신을 흔히 보지 못하게 되면서 그런 일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느 도서관에 강의하러 갔다가 뜻밖에 거기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다.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앞에 시 바구니가 걸려 있었는데, 반가운 마음으로 한 개를 꺼내 펼쳐보았더니 거기에 공광규 시인의 '소주병'이라는 시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옮겨본다.
'술병은 잔에다 / 자기를 계속 따라 주면서 / 속을 비워간다 /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
길거리나 /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 문 밖에서 /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 나가보니 /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 빈 소주병이었다'.
시의 제목은 '소주병'이지만 실은 아버지를 그리는 노래다. 시인이 그린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비우고 또 비운 나머지 마침내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처럼 초라해지고 만 내 아버지의 초상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공광규 시인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소주병은 고무신과는 달리 아직은 흔히 볼 수 있어서 자주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을 테니 부럽다. 또한 도처에서 아버지를 만나니 그 마음이 애달픈 순간도 무시로 닥칠 터이다. 그것은 부러운 일인지 아닌지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