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마감일 코앞 베끼기 빈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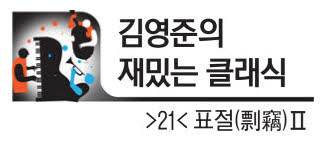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기, 궁정과 교회에 고용돼 창작활동을 했던 음악가들의 작품은 고용주의 소유였다.
'작곡가=작품의 주인'이라는 인식은 베토벤 시대에 와서야 자리 잡았다.
18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작곡가들은 산업도시에서 주로 작품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형성된 작곡가의 '자기 작품'이라는 개념은 예술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또한 지적 재산권 개념의 등장이었다.
그러나 19~20세기에 와서도 자신 혹은 남의 작품에 대한 도용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영감을 받은 선대 작곡가의 작품 일부분을 자신의 작품에 배치하는 경우는 꾸준히 이어졌다.
이는 특정 영화의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해 해당 작품과 연출자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오마주(Hommage)'와 유사성을 띤다. 또한 선배들의 음악이나 민요 등의 특정 주제를 활용한 변주곡과 광시곡들도 탄생했다.
몰래 가져다 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로시니(1792~1868)는 '표절'과 관련한 일화를 다수 만들었다. 어느 날 로시니는 제자가 작곡한 오페라 '사막'의 초연을 봤다.
공연 후 로시니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좀 전에 본 오페라 말이야, '사막'이 아니라 '네거리'더군. 알 만한 사람(작곡가)들은 다 만나게 되던 걸." 여러 작곡가의 작품들을 요소요소에 도용한 것을 힐난한 거였다.
이처럼 남의 표절을 지적했던 로시니는 정작 자신의 표절에 대해선 관대했다.
깊은 사색이나 고뇌 끝에 작품을 만들어 내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로시니는 출판업자나 흥행사가 정한 마감 일에 이르러서야 쉽게 작곡했다. 창작력이 떨어지면, 자신이든 남의 작품이든 도용도 빈번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은 오페라 '영국 여왕 엘리사베타'와 '파르미라의 아우레리아노', '너무한 오해'에서도 서곡으로 쓰였다.
또한 로시니는 '세비야의 이발사'에 하이든의 '현악 4중주 46번'의 일부분을 갖다 썼다.
'면도칼'이라는 부제가 붙은 하이든의 작품이 도용된 것을 눈치챈 친구가 비난하자, 로시니는 "이발사가 면도칼을 좀 썼기로 문제 될 게 있나"라며 익살을 부렸다고 한다.
로시니의 낙천적 음악관은 '표절'과 관련된 일화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로시니는 현재의 법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엄연한 범죄자였다.
/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김영준의 재밌는 클래식·(18)말러의 시대]사후에 인정받은 '교향악 절대기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7/2019071101000973800046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