쇤베르크, 상투적 조성음악 거부
진실 추구위해 불안·긴장 등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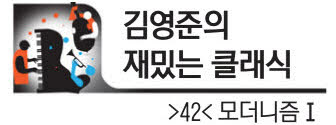
"독일 음악이 앞으로 200년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20세기 초 아르놀트 쇤베르크는 조성(調聲) 음악을 대체할 '12음 기법'을 창안하고 나서 이같이 말했다.
서양음악사에서 바흐의 '평균율'로 주도권을 쥐었던 독일 음악이 자신의 12음 기법으로 인해, 다시 서양음악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찬 발언이었다.
열두 개의 반음으로 만든 음렬(音列)을 근거로 한 작곡법인 '12음 기법'은 조성과 무관할 수 있으며, 악곡을 통일시키는 선율적 근거도 얻을 수 있었다. 쇤베르크는 왜 조성과 결별을 택했을까?
1900년을 전후한 오스트리아 빈에는 쇤베르크와 알반 베르크, 안톤 베베른을 중심으로 한 '제2 빈 악파'(제1 빈 악파는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토벤)와 '빈 왈츠'가 공존했다. 자신의 음악세계를 추구한 작곡가와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작곡가로 나뉜 것이다.
왈츠와 희가극인 오페레타를 작곡한 음악가들과 달리 쇤베르크와 그를 따르는 작곡가들은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해 주는 작업을 해 나갔다.
기존의 상투적인(조성) 어법으로 만들어진 음악을 거부한 쇤베르크는 조성에 의존하지 않고 음악을 구축할 원리를 찾아냈다. '12음 기법'이 조성을 대체하면서 이전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불협화음들이 작품 전면에 나타났다.
쇤베르크의 음악적 표현은 이전 시기 작곡가들이 즐겨 택했던 사랑과 기쁨, 슬픔이 아니었다.
'기대, Op 17'(1908년)이나 '달에 홀린 피에로, Op 21'(1912년)에서 보듯 불협화음을 통한 불안, 긴장, 두려움, 내적 갈등, 충동 등이었다.
당시 쇤베르크는 "예술은 장식이어선 안 된다. '진실(Wahrheit)'이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논제를 남겼다.
음악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진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과 사회학, 미학 등 광범위한 연구활동을 한 20세기 독일의 사상가 테오도르 W. 아도르노 또한 "청중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선율은 자체의 비판력을 상실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불협화음은 유희·순응적 태도를 부정함으로써 '진실'에 다가서게 한다"는 견해를 더했다.
쇤베르크로부터 시작되는 모더니즘 음악들은 클래식 좀 듣는다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작품으로 꼽힌다. 작곡가의 초기작으로, 조성과 결별하기 전 작품인 '정화된 밤, Op 4'(1899년)로 친숙해져 보자. 이어서 투철한 작가 의식을 앞세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 위대한 산물들을 접하면 좋을 듯싶다.
/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