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지락 황금어장'이었던 선감도등
갯벌 망가져 가구당 年40만원 수익
매년 수십억 들여 치어·종패 방류
"뿌려도 걷어들일 수 없어…" 한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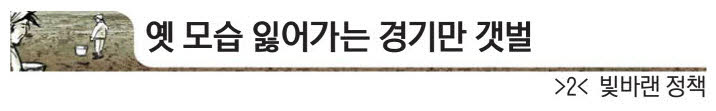
2000년대 초만 해도 안산 선감도는 전국 최대 바지락 황금어장으로 꼽힌 곳이다. 그 옛날 이곳 어민들은 맨손으로 바지락을 캐 하루에 많게는 1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랬던 이곳엔 현재 83가구가 남아 갯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근근이 갯벌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갯벌 체험프로그램도 2003~2004년도 당시 연간 2만여명이 찾던 체험객 수가 최근엔 10분의 1로 줄었고, 가구당 연간 4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뿐이다.
지난해 2억원 정도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아 바지락 종패를 갯벌에 뿌려놨지만 얼마나 걷어들일지는 알 수 없다.
황금어장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18일 만난 선감도 어촌계 관계자는 "포기할 수 없어 그냥 (갯벌을)지키고 있다"고 했다.
시흥 오이도 갯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리고 체험객이 낸 체험비를 다시 종패를 뿌리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어민들이 맨손으로 바지락이나 동죽을 캐 수협에 수매하는 '맨손잡이' 어민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지만 과거 왕성했던 당시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어민들의 목소리다.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만' 일원의 지자체 등이 갯벌을 살리고자 매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입해, 치어·종패류 방류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한다.
도는 매년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최근 5년 간 121억원을 들여 넙치 등 치어 8종 1억4천607만미를 방류했다.
종패류 또한 지난해 12억4천만원을 들여 새꼬막 등 3종 종패류 335t을, 올해도 12억5천만원을 들여 303t을 살포한다.
화성시도 2018년부터 매년 9억8천만원을 들여 점농어, 넙치, 조피볼락(우럭) 등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2018년에는 1천500만미를, 지난해엔 2천545만미를 방류했다.
종패류도 2018년 10억원, 2019년 9억4천400만원, 2020년 12억5천만원을 들여 각 383t, 301t, 300t가량 방류한다.

안산시도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이란 이름으로 지난 1995년부터 매년 7억원 가량을 들여 조피볼락, 넙치 등 어류를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넙치와 참돔 등 3개 종 229만미를 방류했다.
종패류 방류도 함께 진행하는데, 올해 2억9천800만원이 편성돼 연중 방류를 목표로 계획 중이다. 아울러 50억원을 들여 풍도 연안에 물고기가 모여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만에서 수십년째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은 한 목소리로 "뿌려도 걷어들일 수 없는 게 경기만 갯벌과 바다의 현실"이라며 "(차라리)어촌체험 등의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