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에 지자체 끼어드는 모양새 '괴이'
개발·운영비 시민 혈세로… 경쟁력도 의문
배민 헛발질에 뭇매 토종플랫폼 죽이기일뿐

남서쪽 중소도시 앱이 주목받은 건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헛발질을 해서다. 지난 4월, 수수료 체계를 바꾼다고 해 공분을 샀다. 과도한 수수료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표는 사과했고, 며칠 뒤 철회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각을 세운다. '경기도 형' 공공배달 앱을 내놓겠다며 군산을 찾아 협약을 맺었다. 다른 광역·기초 지자체도 줄지어 가세했다. '명수'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배민은 정액을 정률로 변환하면서 수익 증대를 꾀했다. 꼼수 인상이다. 시기도 적절치 않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죄다 문 닫기 직전이었다. 시장 독점 논란에 여론은 더 나빠졌다.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인 외국자본과의 합병 이슈도 악재가 됐다.
배민 형제가 우아하지 않다고, 시장·군수가 배달통을 둘러메는 건 괴이하다. 민간 영역에 공공이 끼어드는 모양새다. 기업이 잘못한다고 정부가 대신 나서야 하는 건 아니다. 소비자가 공짜라고 진짜 공짜가 아니다. 개발비가 들고, 운영비를 내야 한다. 명수도 유지비가 1억5천만원이다. 시민 혈세다.
경쟁력도 의문이다. 공공 앱은 서비스 질에 태생적 한계가 있다. 소비자 니즈(Needs)를 따라잡는 속도 경쟁에 불리하다. 배민의 간편 결제 시스템과 리뷰 빅데이터, 배달기사 연동망, 이용 편의성은 함부로 넘볼 수 없다. 10년 업력(業力)의 충적물이다. 시스템 개선과 유지비용이 수백억원을 넘는다.
공공 앱의 민낯을 보자. '제로페이(Zero Pay)'는 2018년 서울시가 '수수료 제로'라며 출시했다. 박원순 시장의 야심작이다. 2019년 결제액 목표치는 8조5천억원이다. 올 2월에야 누적 결제액 1천억원을 넘었다.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다. '점유율 제로 페이'라는 오명이 쓰였다.
벤처 업계는 냉담하다. 국산 플랫폼을 죽이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거다. 소비자는 편리한 경험을 택한다. 배민이 쪼그라들면 중국의 '메이퇀와이마이'가 점령할지 모른다. 쿠팡이 사라지면 아마존이, 알리바바가 상륙한다. 네이버가 시들면 구글과 유튜브로, 카카오가 무너지면 인스타그램과 페북으로 갈아탈 것이다.
'포노 사피엔스' 저자인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SNS에서 "토종 플랫폼을 공격하고 규제로 막으면 우리 경제가 탄탄해질까요?" 라고 묻는다. 구시대를 고집한다면 10년 후 모든 것을 글로벌 플랫폼에 빼앗길 뿐이라고 주장한다.
118년 된 미국 백화점 체인 JC페니가 파산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센추리 클럽인 시어스, 니먼마커스, 메이시스도 도산했다. 온라인에 치여 쇠락하다 팬데믹에 휩쓸렸다. 100년 넘는 백화점들이 줄줄이 문 닫는 건 100년 된 인류의 소비 행동에 혁명적 변화가 왔음을 의미한다.
팬데믹 쇼크에 경제의 축이 더 빠르게 모바일 디지털문명으로 이동하고 있다. 생산과 유통, 소비의 표준이 달라진다. 경제기상도는 코로나 전과 후로 갈릴 전망이다.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석유 화학이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의료, 안전, 환경, 언택트(Untact), 로봇 산업이 신 성장축이다.
전화 안 해도 스마트폰을 터치해 피자에 치킨 시켜먹으며 프로야구를 본다. 배민이 바꾼 풍속도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버려진 영수증을 모아 유니콘 신화를 일궈냈다.
그런데, 헛발질했다고 사방에서 뭇매질이다. 회초리를 든 게 아니라 '죽이자'고 대든다. 스타트업(Start up)을 꿈꾸는 청년 세대의 '대한민국 롤 모델(role model)'이 초라해지고 있다. 대체 어쩌자는 건가.
/홍정표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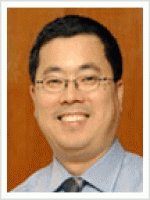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