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준생 등 직고용에 '불합리' 제기
도로공사·서울대병원도 갈등 표출
정부 허술한 가이드라인 원인 지목
당초 목표 민간부문 확산 쉽지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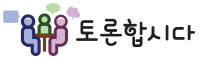
2017년부터 시작된 정규직 전환사업은 정규직 대상과 전환 방식을 놓고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을 직고용 형태인 청원경찰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직원들과 그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들이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논란은 단순히 인천국제공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환을 시작한 한국도로공사와 분당서울대병원 등 타 공공기관에서도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하게 표출됐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상당수가 임금, 복지 등 열악한 처우에 처해있고 1,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리로 내몰리는 식의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갈등 또한 늘어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먼저 정규직 전환에 성공하면 민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보고, 서둘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으로 진행된 탓에 회사와 노동조합의 갈등, 나아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사례는 이 같은 갈등이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각 공공기관의 자율에 내맡긴 정부의 허술한 가이드라인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도 정규직 전환 방식을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에 편제 되느냐 등 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었고 직무범위, 승진체계, 채용절차, 정년 문제 등 여러가지 현안들을 모두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이 다루면서 파업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전환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다보니 기존 직원들의 불만 등을 간과했던 게 결국 '공정성 시비'까지 불거졌습니다.
더불어 이들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비롯, 사회 전반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이 같은 논란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만 계속 늘어나면서 애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민간 부문 확산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단발성 대규모 전환을 시도하긴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정규직 전환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최근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7년 32.9%였다가 1년 뒤 33%로 조금 더 올랐고 지난해에는 3%p 늘어나 36.4%를 기록하는 등 다시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고용의 유연성을 앞세워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해왔습니다. 20년 이상 이 체제가 유지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골도 깊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들어갈 사회에서 노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토론합시다-잊힌 군인들 '국민방위군']민간인 60만명 반강제 징집… 아직도 정확한 피해규모 몰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6/2020062101001000100049341.jpg)
![[토론합시다-위험에 방치되는 아이들]아동학대 근절, 얼마나 더 희생돼야 하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6/20200614010006493000315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