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 접착제로 라벨 붙여 질 저하
국내산, 식품 미접촉 부분만 인정
수입산은 검사기준 없어 이중잣대
업체들 플라스틱 수거 기피현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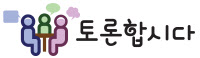
나이키, 아디다스, 자라 등 해외 유수의 기업들은 쓰임을 다한 페트병을 재활용해 의류를 비롯해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을 제작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 그 중에서도 재활용 페트병은 도시의 유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 재활용 페트병의 추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쓰지 못하도록 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시적으로 일회용 컵을 허용했습니다.
다시 페트병(컵)은 도시 곳곳에 늘어났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석유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면서 재활용페트병의 값도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상황이 이같은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의 기업들과 달리, 한국의 기업들은 페트 재활용을 대하는 인식이 매우 인색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신제(석유에서 처음 뽑아낸 플라스틱)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국내산 재활용 플라스틱의 질이 낮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는 음료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페트병의 라벨을 강한 접착제로 붙이는 탓에 뜯기가 어렵고 뜯더라도 접착제 잔여물이 남아 분쇄를 해도 이물질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솜을 제작하는 정도의 중·저급 원료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수입산과 국내산 재활용페트에 대해 이중규제를 들이대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만 활용도를 한정하면서 일회용 컵이나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 재활용 페트에 대해서는 품질을 선별하는 검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국내 재활용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국내 재활용페트가 사용처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각 아파트를 돌며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들이 플라스틱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페트병을 수거하는 가격보다 전문 재활용 업체에 재판매하는 가격이 오히려 낮아져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업체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경기도 전체에서 발생한 생활계폐기물은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이 중에서 28%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비닐·플라스틱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하루 3천535t 가량의 재활용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도내 지자체가 공공·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선 고작 하루에 1천499t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경인일보는 기획기사 '도시 유전(페트병)을 살리자'(7월 13~15일 1·3면 보도=['도시 유전' 페트병을 살리자·(上)]만들어도 팔지 못하는 재활용)를 통해 갈 곳 잃은 재활용 페트를 심층 보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이 마시고 난 후 음료수병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재활용페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두 함께 토론해봅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