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사용 연장은 없다" 선언
지자체 소각시설 한계 '대책 시급'
'쓰레기 줄이기' 함께 고민해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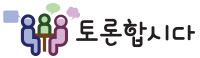
인천광역시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2025년 사용연한이 종료되는데, 인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2025년 이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연장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준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도내 30개 지자체 중 상반기(1~5월)동안 누적 반입 총량 대비 매립 비율이 벌써 50%가 넘는 지자체가 10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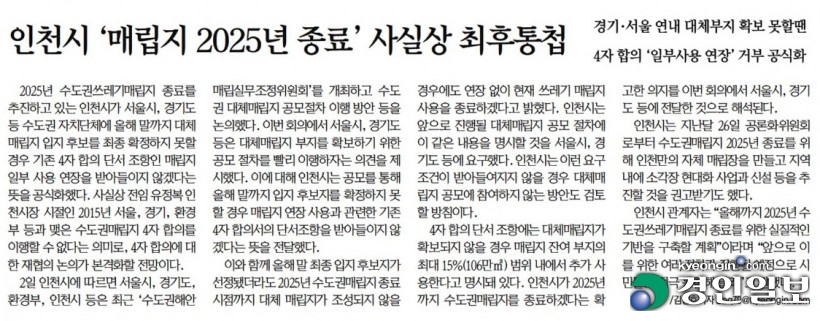
실제로 2018년 기준 전국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폐기물 약 4만6천700여t 중 약 43%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우리가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부와 자치단체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인일보가 지난 3월 통큰기획 시리즈로 보도한 '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를 보면 현재 수도권은 '쓰레기 직매립' 방식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각종 환경기준을 통과해 매립장 내부에 들어온 쓰레기는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에 묻히는데, 240m×220m 크기를 1블록으로 해 모두 16개의 블록으로 이뤄져 있고 정해진 구역부터 폐기물을 매립합니다. 차량에서 내려진 폐기물은 펼침, 다짐작업을 거쳐 매일 흙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은 5m 높이를 1단으로 해 모두 8단으로 이뤄지고 1단이 쌓일 때마다 50㎝씩 중간 복토가 생기고 매립이 완료되면 매립장은 40m 높이의 폐기물이 쌓입니다. 폐기물은 땅속에서 부패하면서 침하가 이뤄지는데, 현재 매립이 완료된 제2매립장은 약 10m 높이의 언덕이 됐습니다.
또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집정을 통해 처리장으로 옮겨지며, 매립 가스는 포집정을 통해 발전소로 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1매립장에는 8년간 약 6천400만t, 제2매립장에는 18년간 약 8천만t의 폐기물이 매립됐고 두 매립장의 매립 면적만 해도 축구장 717개 규모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는 여전히 넘쳐납니다. 2025년 매립지 운영이 종료되면 밀물처럼 쏟아지던 쓰레기들을 처리할 곳이 없어 말 그대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시설 역시 부족한 상황에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인구당 소각시설 현황을 보면 인천시(9개 소각시설)는 32만명 당 1곳, 경기도는 50만명 당 1곳, 서울시는 194만명 당 1곳으로 당장은 서울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도와 인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경기도는 총 26개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택지개발에 따라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각시설 노후화로 소각장 성능이 떨어져 매립지를 이용하는 도내 지자체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사실 '환경오염'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쓰레기를 만들었나요?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모두 함께 고민해봅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