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 답습 벗어나 동시대적 담론 반영
장기 입주작가 1기·대구대 교수 활동
"아트플랫폼,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교육자로서 연구·봉사 꾸준히 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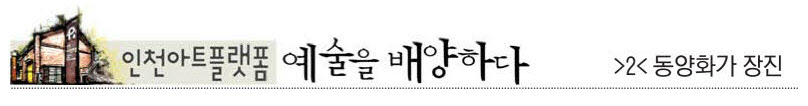
그가 보여주는 달의 관념성은 마치 사군자화가 지니는 추상성과 맥이 닿아있다. 그의 그림에서 달, 풀, 구름 등등의 대상은 '무엇'이라기보다 '무엇 같은 것'이라는 식의 접근이 타당할 것이다.
즉 달, 풀,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식의 설명이 된다. 이것은 동양화가 갖는 사유적 특성이기도 하며 장진의 추상적 시각이 관념의 대상에서 비롯됨을 뒷받침한다.
- 최승훈 전 대구미술관 관장의 '장진의 풍경 그림' 중에서
장진(사진) 작가는 2002년 첫 개인전에서 갯벌에 핀 소금꽃을 소재로 생명성에 초점을 둔 작품을 내놓았다. 전통적 매체인 한지에 먹으로 주조한 작품들에는 당시 작가의 작업실이 있던 강화도의 갯벌과 바다가 담겼다.
이후 장 작가는 심상 이미지를 표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2006년 세 번째 개인전 '시적 공간(Poetic Space)'을 통해 자신의 미학적 노선을 드러냈다.
작품들은 강화도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풍경의 표면(감각적 사실로서의 현상)과 이면(관념적 사실로서의 본질)의 경계를 허문 거였다. 2007년 네 번째 개인전 '기상도(氣象圖)'에서 작가는 '시적 공간'의 개념을 보다 강화했다.
장 작가는 2009년 가을 인천아트플랫폼이 개관하면서 이곳으로 창작 공간을 옮겼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작가로 참여했으며, 이듬해에는 아트플랫폼의 장기 입주작가(제1기)에 선정돼 인천 중구에서의 창작 활동을 본격화했다.
2011년엔 OCI미술관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그해에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현대미술전공 교수로 임용돼 대구와 인천을 오가면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 작가는 꾸준히 동아시아 전통 회화의 미학적 담론을 토대로 현대적 변용을 시도해 왔다. 전통의 답습에서 벗어나 동 시대적 담론과 정서를 반영하려는 시도를 거듭하며 현대 동양화가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천 만석동의 우리미술관에서 자연과 달을 주요 모티브로 한 동양화 작품으로 전시회를 연 작가는 올해 9월 대구 신세계갤러리에서 스물다섯 번째 개인전 'Calm-Shine_달이 비추다'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과 인터넷 화상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장진 작가를 인천에서 만났다. 장 작가는 "화상 수업의 경우 집과 작업실이 있는 인천에서 주로 하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기억을 10년 전으로 돌려서 인터뷰를 이어갔다. 그는 "인천의 규모 있는, 공식화된 레지던시가 두 곳인데, 두 곳 모두 경험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장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의 장점으로 좋은 작가들과의 교류를 꼽았다.
"국내외의 좋은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외국에 견학을 가더라도 작가들과 호흡하긴 힘든데, 아트플랫폼에선 교류가 많았어요. 작가들을 많이 알게 됐고, 그들과 현대 예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제 작업에 대한 것도 돌아봤고, 힘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장 작가는 올해로 11년째 운영 중인 인천아트플랫폼이 외국에도 많이 알려졌다고 했다. 그는 "얼마 전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작가 선발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오네' 하면서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과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타이완, 상하이 등에서도 전시활동을 펴고 있는 장 작가는 교육자(교수)로서 해야 할 교육과 연구, 봉사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후학 양성과 함께 작품 활동(연구)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최근 전시하자고 연락 온 곳도 있고요. 책도 쓰고 있습니다. 봉사는 학교가 있는 대구와 함께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인천에서도 할 것입니다. 강화 전등사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위원으로 수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인천에 대한 애정 때문입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