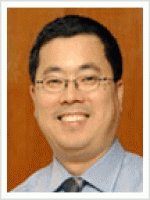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의기투합 수도권 넘어서자" 당찬 목소리
천년역사 쪼개자는 것은 '실사구시'보다
'위인설관' 앞서는 주장… 세상이 달라졌다

의정부지역 국회의원이 '경기도를 남북으로 갈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장에서다. 북도 설치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46%)이 반대(33%)를 앞선다며 "도민의 이익은 도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현 단계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을 뺐다. 직설을 피한 화법(話法)은 여당 의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일 것이다.
경기 분도는 도세(道勢)가 급성장한 1980년대 후반 주창됐다. 한수(漢水) 이북에 대한 차별과 홀대론이 발원이다. 1992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선거철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으나 30여 년 지나도록 별 진척이 없다. 경제·사회·정치 비용에 상응하는 수익 창출에 회의와 의문이 여전한 때문이다.
북부에서 철 지난 유행가를 부르는 사이, 인천에서는 서부 지역을 합치자고 한다. 부천·시흥·김포시를 통합해 500만 명 인구를 가진 제1 광역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발상이다. 분도론에 휩싸인 때에 통합을 실현하지 못하면 도시통합은 영영 불가능하다고 불을 지른다. 분열의 틈새를 파고들어 반사이익을 챙겨보자는 속셈이다.
도의 변방 인천은 1980년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했다. YS의 가신(家臣) 최기선 시장의 주도로 강화군과 김포 일부가 인천으로 강제 편입됐다. 지역민들의 의사를 묻는 변변한 여론조사도 없었다. 강화 출신 기업인은 요즘도 '왜 우리가 인천이냐'고 한다.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서부평야 문전옥답을 내놓으라 억지를 부린다. 그나마 힘없는 야당 인사의 입이란 게 다행스럽다.
분도와 통합은 도정 이슈가 못 된다. 수면이 일렁일 뿐 아래는 고요하다. 구체화 될 만한 동력도 보이지 않는다. 당위성과 합목적성이 부족하고 주목도가 낮다. 정작 도(道)와 이 지사의 고민은 '특례시'일 거다.
도내에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10곳이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법이 통과할 경우 전체 지자체의 3분의1이 특례시가 된다. 수부 도시 수원뿐 아니라 주요 도시가 몽땅 떨어져 나간다. 도내 인구 1천331만명 중 63%인 834만명이다. 지방세 총액은 14조4천여억원으로, 전체 25조원의 57%를 점한다. 내년 1월 시행되면 경기도는 껍데기만 남은 초라한 신세가 될 처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특례시 반대론자다.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아 지자체 간 위화감과 차별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이 특례시와 일반 시·군의 불균형 발전으로 전이될 수 있다. 가평·양평·연천군, 여주·포천시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30년 안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참고·경기도 소멸 위험지수). 이들 지역에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건 명을 재촉하는 재앙일 것이다.
전국에 재결합 바람이 거세다. 대구와 경북, 전남과 광주, 대전과 세종, 충남이 뜨겁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산·울산·경남을 묶는 큰 그림을 그리자고 한다. 메가시티를 건설해 수도권을 넘어서자는 당찬 목소리다. 방방곡곡이 이처럼 통합을 외친다. 다시 뭉쳐 덩치를 키우고 힘을 기르자고 의기투합 중이다. 그런데 거꾸로 가자고 한다. 천 년 역사를 쪼개자는 건 실사구시(實事求是)보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 앞서는 주장이다. 해묵은 소리에 인천까지 기웃거린다.
한강 이북은 수도권에 접경지, 상수원보호구역이 막아선다. 산악지역이 많고 중첩된 규제로 개발 여건이 열악하다. 독립된 광역지자체가 아니라서 발전이 더디고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다. 수원 사무실에서 연천군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온라인 민원상담을 한다. 세상이 달라졌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