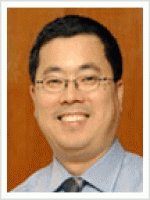1960년대 후반, 서울시는 무허가 판잣집을 정리하기로 하고 광주군에 위성도시인 광주대단지를 조성해 이주할 계획을 세웠다. 철거민들에게 싼 가격에 토지를 분양해주고 세금을 면해주겠다고 했으나 이는 말뿐이었다. 주민 불만은 극에 달했고, 서울시장은 약속한 면담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주민들은 폭발했다. 1971년 8월10일 대단지 주민 5만여명이 성남출장소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세금 감면과 분양가 인하, 공장과 상업시설 설치, 취업센터 설치 등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경찰기동대 700명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분노한 주민들은 경찰을 제압하고 관리사무소와 파출소에 방화하는 등 대단지 전역을 초토화했다.
지나던 승용차와 택시, 버스를 멈춰 세우고 승객들을 모조리 끌어내 운송 수단을 확보한 뒤 서울로 이동했다. 정부는 즉시 사과하고 이주민 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등 화를 달랬다. 이틀 뒤 서울시장이 광주대단지를 성남시로 승격하고 주민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위대는 자진 해산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한 해방 후 최초의 시민 생존권 투쟁이었다. 일부 학자는 이를 폭동으로 규정한다. 반면 처음부터 지역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을 맞아 올바른 명칭 지정 등 기념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사업추진위를 구성해 각종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공동으로 학술토론회, 주민주도형 골목축제, 기획 공연 및 전시, 사적지 기념 동판 설치, 시민통합 토크쇼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대단지 사건은 전태일 분신사건과 함께 하위계층의 권익향상에 발자취를 남겼다. 세제지원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무력진압 대신 굴욕적인 협상을 택한 드문 사례다. 하지만 관련자 명예회복이나 보상은 여전히 미미하다.
50주년을 맞아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100만 성남시는 서울에서 쫓겨난 빈민들의 서러운 눈물과 한(恨)을 딛고 일어섰다. 그런데도 정부의 부당한 폭력에 항거한 투쟁을 폭동이라 부른다.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 거창한 포장은 아니더라도 '광주대단지(또는 성남) 항쟁' 정도는 돼야 어울릴 만하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