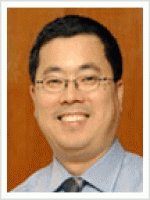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고통은 견딜 수가 없다/(중략)…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 열사는 탑골공원과 남대문에서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다니던 이화학당에 임시휴교령이 내리자 고향인 천안으로 가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일제의 무자비한 고문으로 18세 나이에 순국, 국민 누나로 추앙된다.
3·1운동은 일제의 강압 통치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을 쟁취하려 분연히 일어선 한민족의 의거(義擧)다. 전국 1천500여단체, 참가 인원 200여만명, 사망자 7천500여명, 부상자 1만6천여명, 체포자 4만7천여명이었다. 방방곡곡 거리는 온통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다.
국기(國旗) 제정은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이 시작점이다.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 같은 해 수신사로 일본에 가던 박영효가 배 위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다음 해인 1883년 5월 고종은 국기로 제정·공표했다. 이후 국민들과 멀어졌으나 3·1 만세운동을 통해 민족 정신의 상징이 됐다.
태극기가 다시 거리로 나선 건 2002 한일월드컵대회를 통해서다. 광화문 거리에 내걸린 대형 걸개는 승리를 향한 국민 염원이었다. 태극 문양을 형상화한 의상과 모자가 유행했고, 벼락스타가 탄생했다. 기쁨과 환호, 좌절과 탄식의 순간에도 저마다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를 축하하고 위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태극기를 보는 시각이 갈리게 됐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을 덮으면서다. 태극기가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특정 세대를 지칭하는 도구가 됐다. '극우'의 전유물로 각인되면서 다른 쪽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3·1절 102주년 기념일에 종일 비가 내렸다. 가뜩이나 보기 힘든 태극기 몇 개, 거리에 걸렸을 뿐이다. 괜한 오해를 살지 몰라 국기 게양이 꺼려진다는 가정도 있다. 거센 빗줄기에 흠뻑 젖은 태극기가 기운을 잃고 축 늘어졌다. 깃대도 무겁다며 버거워한다. 나라의 얼굴이고, 민족의 정신이어야 할 대한민국 국기가 왜 이리 서러운가.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