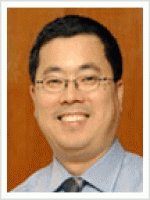1970년대, 시골 중학교 새내기들의 교복은 몸집보다 훨씬 컸다. 바지는 헐렁했고, 품이 큰 웃옷은 꺼벙했다.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자녀들 교복은 큰 부담이었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기, 딱 맞는 옷은 가성비가 떨어지기 마련. 무조건 한두 치수 큰 교복을 사 자녀에게 입혔다. 외모와 복장에 민감할 나이지만 비슷한 처지였기에 창피한 줄 몰랐다.
고등학교 시절, 여름 하복은 청색 계열이었다. 다른 학교에 비해 촌스럽지는 않았으나 모자가 맘에 들지 않았다. 검은색 빵떡 모자였는데, 다른 동급생들도 교문을 나서면 가방 속에 처박았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쓰고 다니라 해도 따르는 학생은 드물었다. 등교할 때 잠깐 쓰는 애물이었으나 그렇다고 집에 두고 오면 혼쭐이 나기에 꼭 챙겨야 했다.
1886년 이화학당 재학생들이 다홍색 무명천으로 된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녔다. 우리나라 교복의 시작이라고 한다. 10여 년 뒤 배재학당에서 남학생들이 처음 교복을 입게 됐다. 서양식 교복의 첫 수혜자는 1907년 숙명여학교 학생들이었다. 자주색 원피스와 분홍색 교모가 특징으로, 유럽풍 양장 형태다. 하지만 지나친 파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3년 뒤 다시 자주색 치마저고리로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다.
신학기를 맞아 중고 교복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교복 은행이 인기몰이 중이다. 졸업생들의 교복을 기증받아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에게 저렴하게 파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다. 재킷은 5천원 안팎, 셔츠와 넥타이 등은 3천원 선에 살 수 있어 수요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경기도 내에만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교복 은행이 18곳에 달한다.
형제자매가 많은 50·60대는 형님과 언니 교복을 물려받아 입는 게 자연스러웠다. 새 학기에 교복 사달라고 조르면서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생떼를 썼다. 변변한 교복 한 벌 사주지 못하는 엄마의 속은 어떠했을까. 자식을 키우고서야 가슴 한구석 찌릿해진다.
교복 은행의 성장엔 코로나19가 한 몫 단단히 했다고 한다. 몇 번 입지 않아 새것 같은 교복이 수두룩하다. 후배들에게 물려주자는 선배의 사랑이 애틋하다. 학부모와 학생도 스스럼없이 중고 매장을 찾아 맘에 드는 옷을 고른다. 어린 시절, 새 교복이 뭐라고 엄마의 마음을 후볐는지. 유년(幼年)의 기억이 때론 불편하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