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년' 아직 진실 안 밝혀져
살아있는 아이들 구조도 못했는데
희생된 아이들 온전히 추모 못하면
우리의 문명 어디로 가고있는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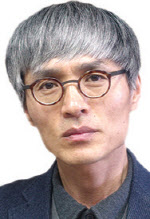
미드의 말처럼 다친 동료를 보살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은 분명 문명과 비문명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같은 질문을 고대 동아시아의 맹자에게 던진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아마도 그는 죽은 이를 추모하는 데서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답할 것이다. 일찍이 맹자는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하면 냉큼 달려가 붙잡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살아 있는 존재를 보살피는 일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죽은 이를 추모하는 일은 경험과 학습의 결과라고 이해하였다. 그는 상고시대에 사자의 시신을 구덩이에 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을 다시 살펴보았더니 여우와 살쾡이가 시신을 뜯어먹고 파리와 등에가 빨아먹는 참혹한 광경을 목도하고는 차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흙을 덮어 시신을 가리게 되었으며 이것이 효자와 인인(仁人)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마땅한 도리를 만들게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맹자는 사자의 시신을 가리는 일이 차마 하지 못하는 불인지심(不忍之心)에서 비롯된 것이며 산자가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일이야말로 문명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이해한 것이다.
맹자의 이 이야기는 현대 고고인류학의 연구 결과와도 다르지 않다. 최근의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들은 적어도 7만년 전부터 시신을 매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네안데르탈인 유적을 조사한 결과, 그중 한 명의 주변 토양 샘플에서 꽃가루 화석을 발견했으며 이는 네안데르탈인이 죽은 이에게 꽃을 바치는 장례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근거가 됐다. 네안데르탈인들은 왜 동료의 시신을 매장하고 꽃을 바쳤을까. 아마도 맹자가 말한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는 일은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생존할 경우 조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살피는 일은 일정한 이득을 예상할 수 있는 반면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일은 살아 있는 자의 생존에 어떤 이득도 가져올 수 없으므로 사자를 매장하거나 추모하는 일은 생존의 필요를 넘어선 고도의 추상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명은 결코 어느 한 세대의 불연속적인 성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다시 말해 산자가 죽은 자의 유산을 이어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죽은 자의 유산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재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에게 끼치고 있는 다양한 의미까지 포함한 것으로 가치의 영역에까지 이어져 있다. 한 사람의 삶을 단순히 생명 활동에 국한하여 파악하고 죽음을 끝으로 망각해버리는 행위는 문명적이라 할 수 없으며 죽은 자의 주검을 돌보고 추모공간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문명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7주기가 지났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진실이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가 처벌받지도 않았다.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지만 온전한 추모가 가능하려면 먼저 진실부터 완전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아이들을 구조하지도 못한데다가 죽은 아이들을 온전하게 추모하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문명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문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