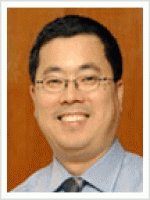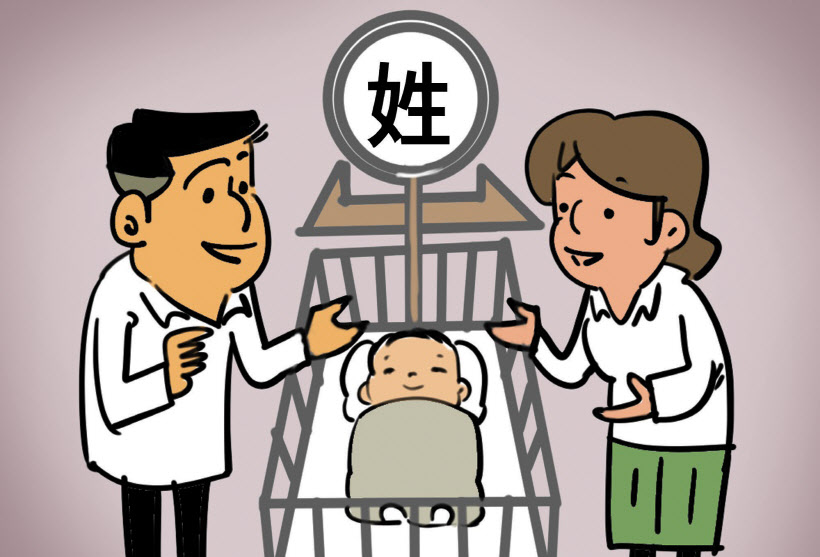
1980년대 소개팅이나 미팅 자리에서 청춘들은 호구조사가 먼저였다. 단일 본 성씨인 경우 같은 성을 가진 이성이 나오면 서둘러 자리를 떠야 했다. 오랜 세월 동성동본(同姓同本) 간 혼인은 관습상 금기시됐고, 법으로도 금했다. 동본이란 죄로 혼인신고를 못해 자녀에게도 피해가 대물림되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 극단적인 선택도 많았다. 여성·시민단체가 나서고 각계의 진정이 잇따랐다. 2005년 법이 폐지되면서 8만여 쌍이 족쇄를 벗어났다고 한다.
호주제(戶主制)는 승계 순위를 아들, 딸(미혼인 경우), 처, 어머니, 며느리 순으로 정해 남아 선호 풍조를 조장했다. 가족 구성원이 호주에게 종속돼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쳤다. 여성은 혼인 전엔 아버지 호적, 결혼 뒤 남편 호적, 남편 사망 뒤 아들 호적에 올랐다. 뿌리 깊은 가부장제를 깨부수겠다며 한 이혼녀가 낸 위헌소송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서 2000년대 후반 폐지됐다.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부모 협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부성(父姓)이든 모성(母姓)이든 상관없이 자율 결정이 가능해지는 거다. 자녀의 성을 결정할 시점도 혼인신고가 아닌 출생신고 때로 바뀐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의 핵심 내용이다. 다양성과 보편성, 성 평등을 지향하면서 수혜자를 혼인·혈연관계 중심의 '정상가족'에서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부성 우선주의'를 벗어나자는 취지에서다.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 구분도 폐기된다. 법률혼과 혈연가족 밖에 있는 비혼 동거 등 가족 형태도 법·제도 안으로 들어온다.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방송인 사유리로 인해 관심이 높아졌으나 여성 단독 출산을 위한 정자 기증은 불가능하다.
성리학(性理學)을 추앙한 조선 시대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극성기였다.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쫓을 수 있는 권리(칠거지악·七去之惡)를 줬다. 불과 100여 년 전이다. 서울·부산시장 보선 뒤 20대 페미니즘 논란이 뜨겁다. 여성 할당제에 맞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군 입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 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법 틀을 바꿔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