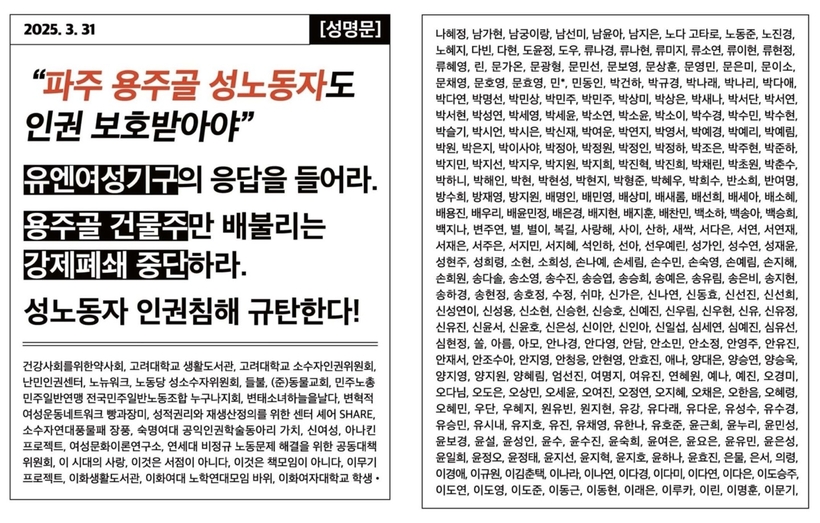하지만 확인은 쉽지 않았다. 경찰도,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도, 입양기관도 입을 꾹 다물었다. 사회부 기자 모두가 달려들어 그물로 바닷속을 긁어 고기를 낚듯, '저인망'식 취재를 했고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타깝지만, 아동학대 취재가 처한 작금의 현실이다.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받다 세상을 떠난 사건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유관기관들은 거의 '봉쇄' 수준에 가깝게 폐쇄적으로 변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지난 2월 이모한테 물고문당하다 사망한 용인 초등학생도 있었고, 사흘 동안 비명소리가 날 만큼 끔찍했던 학대로 사망한 인천 영종도 초등학생도 있었다. 죽지 않았더라도 이번 화성 입양아동 사건처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아동학대는 계속돼 왔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물어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며 반짝했던 관심도 아스라이 사라졌다.
정인이 사건도 그 출발은 어른들의 관심이었다. 아동단체가 끊임없이 사건을 알리고, 입양 전 정인이를 키우던 위탁가정과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들의 용기가 더해져 이 사회 부모들이 정인이 보호자를 자청했다. 반면 이번 사건의 아이 주변엔 아무도 없다. 30개월이 넘도록 어린이집은 다니지 못했고, 동네 주민들도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다. 유일한 외부활동으로 추측했던 교회에서조차 그 가족은 알지만, 아이를 알고 있는 이가 없다. 도대체 그간 아이는 어떻게 살았던 걸까.
혹자는 아동학대 기사를 '지겹다'고 말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늘 있었고 새로울 게 없다는 것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괴로워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묻고 쓸 것이다.
/공지영 사회부 차장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