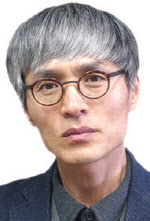
앞의 세 영화가 세간의 호평에 어울리는 수작이라는 데 기꺼이 동의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작품은 '학교 가는 길'이다. '학교 가는 길'은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가 세워지기까지의 투쟁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로 '노매드랜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영화다.
'노매드랜드'를 보며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엔딩 자막이 올라갈 때 스왕키 역을 스왕키가, 린다 역을 린다가, 밥 역을 밥이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다. 주인공과 몇몇 주요 배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연기자가 아닌 실제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학교 가는 길'도 마찬가지다. 다큐멘터리인 만큼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연기자가 아니라 실제의 인물들이다. 이은자 역을 이은자가, 정난모 역을 정난모가, 조부용 역을 조부용이, 장민희 역을 장민희가, 김남연 역을 김남연이 맡았지만 이들은 모두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로 영화에 나오는 대사와 몸짓, 눈물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의 삶이다.
우리 모두 기억하는 것처럼 지난 2017년, 서울 강서구에서는 서진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회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강서구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행정예고를 하자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여 이루 말 못할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영화에는 나오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차마 이곳에 적지 못하겠다.(그런데 감독 또한 영화에 차마 다 담지 못했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다수의 주민들이 장애인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사실 특수학교를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는 애당초 있어서는 안 될 자리였다. 학교 부지에 학교를 짓는 것은 법적, 행정적으로 정당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필요한 특수학교를 짓는 일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수의 주민들이 학교 설립에 반대함으로써 약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학교 가는 길'은 바로 그날의 토론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작으로 서진학교가 개교하기까지 험난했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9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만나 대화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고, 내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교황의 이 대답이 한국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장애인을 혐오하고 약자를 차별하는 헬 조선이라면 그 헬을 만든 장본인은 누구인가.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는 않겠다. 다수의 횡포에 저항하기 위해 어머니들은 무릎을 꿇었지만 그들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운 더 많은 다수의 선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를 본 지 한참 지났지만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라던 어머니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이제 그 어머니들과 함께 우리가 지켜주고 이 나라가 그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것은 곧 당신을 지키는 일이자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P.S. 2020년 서진학교가 개교했지만 정작 설립을 위해 투쟁했던 부모의 자녀들은 그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모두 졸업할 나이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투쟁할 때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 내 아이와 네 아이의 구분이 그들에겐 있지 않다. 오직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만이 있기 때문이다.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