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대 수원농고 학생 '화홍극회'
셰익스피어 작품 '천막 치고 공연'
극단 수원예술극장 'n차 관람' 인기
지금 남은 소극장은 '울림터' 유일
수십년 흘렀지만 '명맥 잇기'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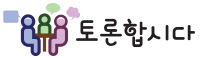
코로나19가 안긴 가장 큰 피해는 일상의 파괴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즐겨야 할 것을 즐기지 못하니 파괴라는 격한 말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뒷전으로 밀린 것은 '문화생활'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그깟 공연 좀 못 보고, 영화관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은 사치스러운 투정이라고 취급됩니다.
여기, 흥미로운 기사가 연재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이 일시적인(?) 사치가 돼버린 지금처럼, "먹고 살기도 바빠죽겠는데, 예술이 왠말이냐"는 우리의 산업화시대에도 예술을 향한 열망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올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그때, 우리 동네의 예술 이야기가 경인일보 '문화, 역사를 말하다' 시리즈를 통해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그 첫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연극계의 효시 '수원 연극사(史)' 입니다.
하루 세끼 굶지 않는 것이 중요했던 1960년대, 경기도 극단들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도 이 때입니다. 특히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뿌리에 '화홍극회'가 있습니다. 화홍극회의 출발은 수원농업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연극을 알려주겠다는 선생님을 따라 열정있는 학생들이 모여 극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천막을 쳐놓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공연할 만큼 열악했지만 당시의 열정은 지금의 무엇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지요.
이때 활약한 학생들이 사회에서 다시 만나 '연극배우'가 되기로 마음 먹은 것이 화홍극회의 시작입니다.
경기도 연극의 시발점이 된 화홍극회 이후 1986년에 극단 수원예술극장이 그 명맥을 잇습니다. 즐길거리가 별로 없던 그때, 배우들의 콧구멍이 보일 정도로 작은 소극장 연극은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소위 '오빠부대'도 있었는데 같은 공연을 수차례 보는 'n차 관람'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극이 잘 되자 하나 둘 소극장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화홍예식장에 극단 성(城)이 소극장을 개관했을 땐 "예식장 청실을 소극장으로 개조하라고 허락하시니 이런 횡재가 어딨으랴, 전무 미쳐 있었다. 날라다녔다. 소극장이라니!" 라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가뭄 속의 단비 마냥, 먹고 살기도 바빴던 팍팍한 그 시대는 공연을 보러 서울을 오갈 수 있는 인생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일 끝나고 돌아가는 퇴근길, 쉴 틈이 조금 난 주말, 멀지 않은 동네에서 연극 한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커다란 낙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수원에 남은 소극장은 단 1곳, '소극장 울림터' 뿐입니다. 극단 '메카네'가 운영하는 곳으로 꾸준히 연극이 올라가고 있지만 어려움은 많습니다. 수십년이 흐른 사이 우리 세태가 달라진 결과지만, 그래도 씁쓸한 뒷맛이 납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경기도연극의 명맥을 잇고자 수원 연극쟁이들은 땀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엔 어떤 문화가 숨어 있을까요. 수원 연극사처럼 우리가 몰랐던 우리동네 문화유산은 무엇일까요. 다함께 찾아 이야기해봅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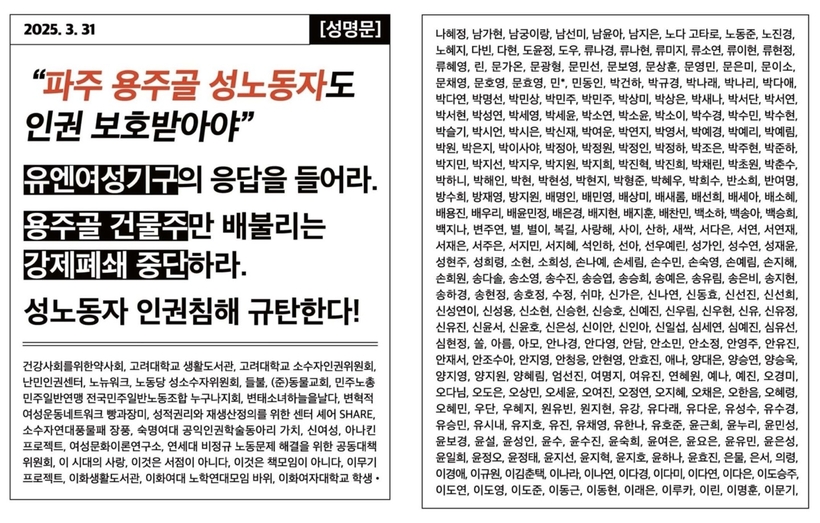






![[토론합시다-고용사회의 유령 '청년니트']취업난에 포기하는 젊은이들…머지않은 미래 마주할 문제 될 수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5/2021050901000298200014831.jpg)
![[토론합시다-가평군 '생명지킴이']누군가의 안타까운 선택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5/20210502010000120000006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