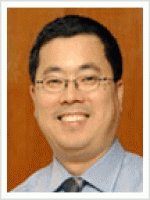인권·노동권 침해에 업주·거래업체엔 갑질
소비자들 잠재된 불만 폭발 탈퇴·불매운동
MZ세대, 비즈니스에 휴머니티·진정성 요구

지난해 쿠팡은 네이버에 이어 국내 온라인 상거래 시장 점유율 2위가 됐다. 미국 아마존, 중국 타오바오, 일본 라쿠텐과 동급 대접을 받는다.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인물이 됐다. 중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가 정치학과 경제학을 배웠고, 잡지를 창간해 매각한 이력을 지녔다. 떡잎부터 달랐다는 칭송이 요란하다.
쿠팡의 핵심 코드는 최저가 상품을 다음 날 새벽 문 앞까지 배달하는 '로켓 배송'이다. '가장 싸고, 빠르게'는 한국인 정서에 최적이다. 김 의장은 빨리빨리 심리를 파고들어 매년 30% 넘는 성장세를 견인했다. 지난해만 7천억원, 누적 적자 4조원이 넘는 기업이 미래가치로 주목받는 이유다.
쿠팡이 복병을 만났다. 이천 마장 물류센터가 발화점이다. 5일 동안 꺼지지 않은 불길에 수천억 자산이 잿더미가 됐고, 소방관이 순직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와 늑장대응이 논란이 됐다. 선풍기 뒹구는 지하 작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노출됐고, 잠재했던 불만 요인이 한꺼번에 분출됐다. 소비자 탈퇴·불매 운동에 가속도가 붙는다.
로켓 배송에 가려진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 침해 현장은 참담하다. 수년 사이 과로한 배송기사가 잇따라 숨졌다.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관리자 눈치를 보며 화장실에 간다는 여성 근로자들 증언은 충격적이다. 배송기사가 배정된 물량을 소화하느라 끼니도 거르는 실태가 알려졌다.
배달 앱 '쿠팡 이츠'는 동종업계 선두주자 '배달의 민족'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식기도 전에 총알 배달한다'는 1인 1품목 서비스가 적중했다. 회사는 기본 3천100원인 배달수수료를 2천500원으로 인하하고, 장거리 할증수당을 깎아내렸다. 처음엔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다 점유율이 높아지자 갑질을 한다고 비난들이다.
입점 업주들도 불만이다. 판매 수수료는 15~25%에서 30%대로 올랐다. 승자에게 우선 노출권을 줘 최저가 경쟁을 유인한다. 약관에 따른 상표권 침해 논란이 거세다. 최장 2개월인 늑장 결제에 흑자 도산을 걱정할 판이다. 자금 사정이 급한 소상공인에 금융대출을 알선해 주는데, 이자는 자부담이다. 내 돈을 받는데 이자를 물어야 하는 해괴한 구조다.
공정거래위는 최근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경쟁사보다 상위에 올린다는 의혹에서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최저가 납품을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민원도 조사대상이다.
지속 가능한 기업의 생존요건으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 강조된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시대 정신이 담겼다. 고객이 집단 불매·탈퇴를 주도하고, 직원들 기본권이 침해되며 사업 동반자에 갑질을 하는 기업엔 미래가 없는 환경인 거다.
온라인 상거래 주역인 MZ 세대는 편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합리적인 휴머니티를 요구한다. 근로자와 상공인들의 희생과 굴종을 자신의 이익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믿기 힘든 최저가로 새벽 배송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개입됐는지 살펴보고 의문을 제기한다. 휴머니티와 진정성을 확인하고서야 의심을 거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쿠팡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근로자와 입점주, 소비자가 '쿠팡이 없는 세상'을 외친다. 플랫폼 기반 혁신기업이 '서민들 생태 교란 종(種)'으로 불린다. 어쩌다 이 모양인가.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