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늘어나는 만큼 국가재정 부담 줄어
인구 逆피라미드화 생산인구 감소등 악순환
노동·연금·복지·재정 등 대수술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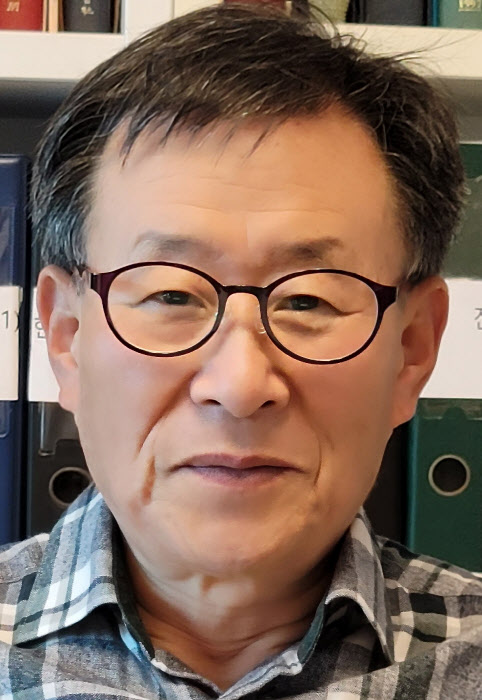
내년 대선에서 중장년과 노동계 표심을 잡으려는 꼼수(?)란 비난이 부담이나 시의성(時宜性)이 요구되는 난제(難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탓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62세)이 2023년부터 63세로 상향조정된 때문이다. 내후년 이후부터는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로 높아진다. 정년퇴직을 현행 60세로 유지할 경우 은퇴 직후의 '소득 보릿고개'만 연장된다. 귀족노조의 정년연장 투정(?)은 언감생심이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은 고민이 깊다.
기획재정부가 고용연장에 가장 적극적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은 노동절벽으로 귀결되어 근로소득 세수입 감소가 불문가지인데 복지지출은 더 커질 예정이니 말이다. 고용연장은 국민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근로기간이 1년 더 연장될 때마다 은퇴 후 국민연금 급여가 1.2%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재정 부담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화근이다. 지난 10년 동안 10대 청소년 인구는 194만명이 감소한 반면, 60대 인구는 무려 278만명이 증가했다.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가 작년부터 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10년 후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설상가상이다. 80대 이상 인구는 2011년 말 103만명에서 지난달 말에는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인구의 역(逆)피라미드화가 심화되면서 생산인구 감소 → 생산성 둔화 → 내수위축 → 세수입 감소와 노인부양 부담 가중 → 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이 불가피한 것이다. 인구수축사회의 임박은 점입가경이다. 통계청은 국내의 총인구가 2028년 5천194만명을 정점으로 이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한국은행은 인구감소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인구 감소는 국가존망과 직결된 문제로 노동력 확보가 최대관건이다. 생산인구유지방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외국인력 활용, 고용 연장, 생산거점 해외이전 등인데 고용연장은 고령층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 축소와 노동력 부족까지 해소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하다.
청년일자리 잠식 논란이 관건이나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경쟁국들은 다투어 정년을 연장했다. 독일과 캐나다는 65세, 프랑스는 62세 등이며 미국과 영국에는 정년제도가 없다. 초고령국가 일본은 2013년에 65세 정년을 의무화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청년실업률이다. 정년연장 의무화에도 청년실업률은 2011년의 11%에서 최근에는 완전고용에 근접한 4%대로 떨어졌는데 산업현장의 구인난은 상당기간 계속될 예정이다. 총인구의 5.4%인 단카이세대(1947∼1949년 출생)의 대거 은퇴를 계기로 정년퇴직 인구가 신입사원수를 능가한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 800만명이 대거 은퇴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천명 이상이 무더기로 정년퇴직할 예정이다. 3D업종은 70, 80대 노인들과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장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수가 2018∼2028년 사이에 717만개가 새로 생겨나는데 비해 구직자수는 679만개에 불과해 노동력 부족 심화를 예고했다.
인구학의 권위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내의 청년실업난이 2027∼2028년쯤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 10∼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닮아가는 모양새를 감안할 때 설득력도 높다. 노동, 연금, 복지, 재정 등의 대수술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