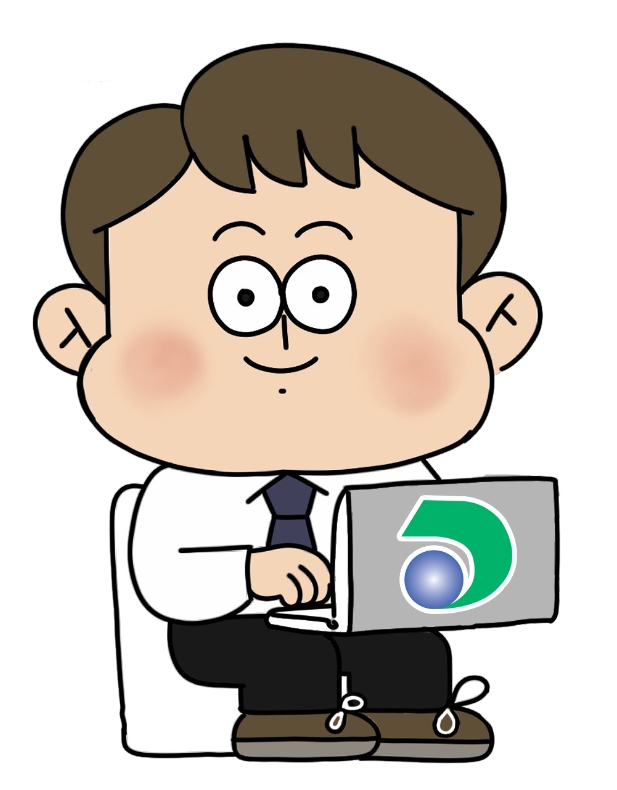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절한 인천 알림이가 되고 싶은 '경인이'입니다. 오늘의 주제 연안여객선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섬 주민들에게 없어선 안 될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출발점엔 '연안해운'이 있습니다. 연안해운은 사람보다는 물건을 나르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연안여객선의 출발점에 연안해운이 있었던 건, 사람보다는 물건을 나를 일이 더 많았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부가 운영한 연안해운은 1886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부터 해운 업무를 인수한 전운국(轉運局)이 해룡호, 광제호, 조양호 등 3척의 기선으로 지방의 조곡을 인천으로 운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관영기업인 이운사(利運社)가 1893년 창설돼 인천에서 마포 간 강운(江運)과 인천에서 군산 간 조곡 해운을 주요 업무로 삼았고, 갑오개혁 이후 일본우선회사가 인천을 기점으로 전라도 군산, 목포, 여수, 경상도 삼천포, 마산, 부산, 염포, 함경도 원산, 서포, 신포 등 지역까지 배를 정기적으로 운항했습니다. 이 시기 쌀과 하포(夏布), 면반물(綿反物), 동물 가죽, 대두 등의 인천항 반입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군산과 목포에선 쌀이, 부산에선 생선, 해초, 솜, 직물 등이 반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산에선 명태 등이 인천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인천의 연안여객선 운항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은 뒤 활성화하게 됩니다. 1950·60년대엔 인천에서 백령도와 덕적도, 연평도, 대부도 등을 연결하는 항로가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강화 교동도를 연결하는 뱃길은 물론, 인천과 충청·전라 지역을 연결하는 여객 항로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1956년 발간된 '경기도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인천항을 기점으로 하는 항로가 당진선, 목포선을 비롯해 총 12개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연안여객선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건 물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었던 겁니다.
1964년엔 인천에서 만리포를 거쳐 제주를 연결하는 정기여객선 '은하호'가 취항했습니다. 은하호는 203t의 현대식 철선으로 길이 40m, 너비 6.4m이고 16노트의 속력을 가진 배였습니다. 정원은 210명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여객선이었다고 합니다. 충남 서산과 당진을 거쳐 인천항까지 운항하는 항로도 있었는데, 충남에서 인천까지 10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하네요. 100명 정도 탈 수 있는 목선이 투입됐는데, 바다 날씨가 안 좋은 날엔 불편이 컸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구(舊) 올림포스 호텔은 인천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는 지표 건물이 됐다고 합니다. 충남에서 인천으로 배를 타고 올라오다 팔미도를 지나면 인천 쪽으로 눈에 띄는 건물은 이 호텔 건물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육상교통의 발달과 차량 보급은 인천과 다른 지역을 잇는 뱃길을 없어지게 한 주된 요인이 됐습니다.
충남에서 인천까지 배로 10시간 가까이 걸리던 게 차로 2~3시간 정도면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연안여객선 대신 차를 탔습니다. 그럼에도 섬과 육지를 잇는 연안여객선의 중요성은 지난 30여 년간 변함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백령도와 연평도, 이작도와 장봉도 등을 연결하는 항로는 '낙도보조항로'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운항에 11시간이나 걸렸던 백령도와 6시간 걸렸던 연평도는 월 5차례 정도 운항할 뿐이었습니다. 승객이 적어 정부가 여객선 운항에 필요한 비용을 대는 구조였죠.
덕적도와 용유도, 대부도, 영흥도 등은 30여 년 전에도 선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반항로'로 분류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낙도보조항로 비율은 줄어들고 일반항로 비율은 커졌습니다. 그만큼 항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10여 개 항로 중 8개 항로가 낙도보조항로였지만, 현재는 3개뿐입니다.

인천 연안여객선엔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백령도를 출발한 한 임산부는 인천으로 향하던 배 안에서 아이를 낳았고, 휴가철 덕적도를 찾은 50대 남성은 인천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심장마비로 위급한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신속한 응급조치 덕에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현지 주민들은 연안여객선을 피난선 삼아 인천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연안여객선은 자동차 부품이나 각종 생필품을 구하는 창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섬 주민들이 여객선 선원들에게 이런 물품들을 구해달라 부탁하면, 선원들은 그 물품을 어떻게든 구해서 다음 배편에 전달해줬던 것이죠.
안타까운 인명 사고도 있었습니다. 1949년 10월 추석 전날 인천에서 강화도로 향하던 '평해호'가 작약도 부근에서 전복돼 790여 명이 숨졌고, 1963년 2월엔 인천을 떠나 교동도로 가던 '갑제호'가 유빙에 부딪혀 침몰, 승객 6명이 숨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1986년 11월엔 외포리를 출발해 석모도로 향하던 카페리 2호가 전복돼 12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되기도 했죠. 연안여객선은 아니지만,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 침몰 사고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사람은 125만3천200여 명으로, 전년도 148만5천200여 명보다 20만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객은 물론 섬 주민들의 이용이 함께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요금 할인 정책 등으로 여객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 연안여객선이 다시 활기를 찾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경인이었습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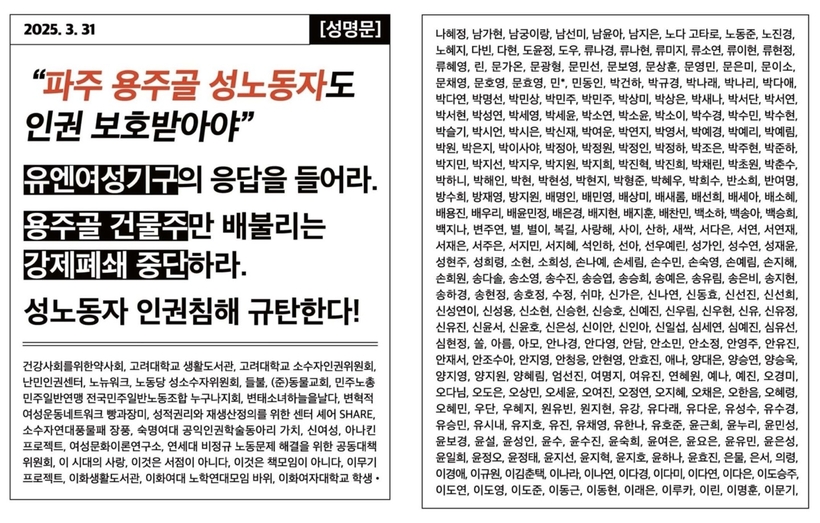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