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중국·해상 발생원으로 꼽아
굴업도·백령도 사곶 해변 등 널려
어민들 그물에 '쓰레기반 새우반'
구지도에선 더미 위 저어새 둥지
미세플라스틱 돌아와 '밥상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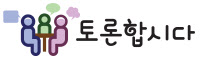
신문 1면에 바다와 쓰레기가 뒤엉킨 사진이 실렸습니다. 실제인가 싶었지만 불행히도 우리와 매우 가까운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갈라파고스라 불리는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해변가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져온 쓰레기를 되가져 갑시다'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로 쓰레기가 뒹굴고 있습니다.
섬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스티로폼 조각과 페트병이 해변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고 쓰레기 포장지 위에는 중국어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은 굴업도를 시작으로 인천·경기만 전반의 해양쓰레기 실태를 확인해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 온다'는 통큰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중국·북한 접경지역과 한강 하구를 끼고 대규모 어장과 국가항만이 있는 인천·경기 앞바다의 해양쓰레기는 사실 한가지 원인만으로 밀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원인은 크게 '육상기인'과 '해상기인', '해외기인'으로 나뉘는데, 인천·경기 앞바다는 이 3가지가 모두 원인입니다.
어떤 원인이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온 신경을 쏟으면 되지만, 불행하게도 인천·경기 앞바다 해양쓰레기는 3가지 원인 모두가 발생량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중화동 해변에는 중국어로 쓰인 생수나 녹차 페트병이 100개도 넘게 널려 있었습니다. 사곶해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수, 간장, 식초 등 페트병 절반이 중국 쓰레기였고 종종 북한에서 내려온 쓰레기도 보인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외국산(?)쓰레기 뿐이 아닙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여러 하천에서 인천 앞바다로 흐르는 육상기인 쓰레기는 정부 추정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한강하구에는 경기도와 서울 사람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들이 축적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젓새우의 70~80%를 잡는 강화도 어민들은 이 쓰레기의 피해자인데, 어민들의 그물에 쓰레기와 새우가 반반씩 걸려들 정도라고 합니다.
인천·경기 앞바다의 한 무인도는 해상에서 떠밀려 온 쓰레기가 쌓여 만들어진 '쓰레기 섬'이 됐습니다. '구지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지도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의 국내 최대규모 서식지인데, 저어새가 쓰레기 더미 위에 둥지를 틀 정도로 섬은 쓰레기 더미입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과연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 상당수는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플라스틱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이른바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미세플라스틱 상당수는 걸러지지 못한 채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기사를 통해 확인한 해양쓰레기의 민낯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인천·경기 앞바다가 꼽히는 것은 이상할 일도 아니죠.
사실 우리가 버린 미세플라스틱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동물성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단백질과 같은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고 있고 생선과 조개류 등이 이를 먹이 삼아 성장하니, 우리 밥상은 미세플라스틱과 함께 차려진다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진주 기자가 직접 실천해 본 체험기를 보면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학생기자들의 '취재 수첩'-우리 생각은요] 한국 갯벌, 유네스코 등재의 의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8/2021080801000275700014071.jpg)
![[토론합시다-도시재생의 길] 우리가 사는 마을, 삶의 질 개선할 수 있는 '개발 방향' 찾기](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7/20210704010000439_1.jpg)
![[토론합시다-소방관 이야기] 수도권 인구 쏠림… 구급대원 업무 과중 심각한데 현실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7/2021071801000673800032111.jpg)
![[토론합시다-주민소환제] 선거직 공무원 투표로 해직… 혼란 줄이고 정치 참여 높이는 방법 없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7/20210711010003958000180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