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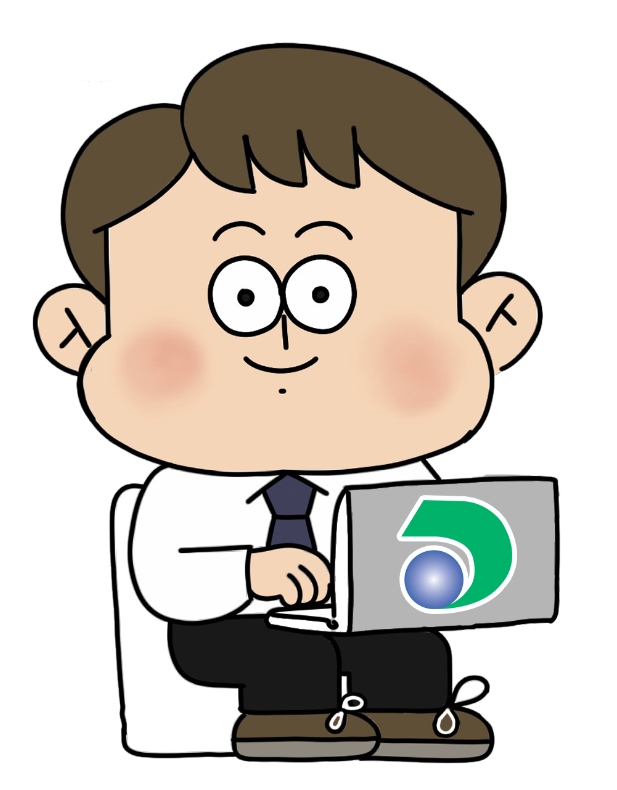
단순히 화물을 보관하던 창고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물론 통관과 검역, 포장, 라벨링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첨단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거 창고로 쓰이던 건물은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경인이가 알려주는 열네 번째 인천항 이야기 주제는 바로 '창고'입니다.

인천엔 1883년 개항 이후부터 창고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인천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보관하기 위해서였죠.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을 자국으로 반출하기 위해 창고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1960·1970년대 인천항 인근에는 10여 개의 창고가 밀집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창고에선 원당(原糖), 밀가루, 식료품, 원사(原絲), 고철 등을 보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인 만큼 화물이 모여있는 창고 주변엔 도둑도 많았다고 합니다.
대형 화재 사고가 있기도 했는데, 1979년 8월엔 인천항 주변의 한 화공약품 보관 창고에서 큰불이 나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기억하는 한 창고업체 대표는 "화재 연기 때문에 인천 전체에서 매캐한 냄새가 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화재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1980년대엔 창고에 원자재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점점 첨단화 되는 창고, 검역·포장·라벨링 등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체의 역할 맡아
'원스톱 처리' 통해 물류비 절감하고 시간 절약
중국과 수교를 맺은 1992년 이후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종류와 크기가 다양해지면서, 인천항 주변 창고의 기능도 많아졌습니다. 원자재뿐 아니라 다양한 소비재 등이 인천항으로 수입된 겁니다. 중국과 가깝고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에 있는 인천의 입지가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창고는 점점 첨단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대형 창고는 화장품과 식품, 의류 등 7천여 가지 소비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자라, 코스트코 등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가 이곳에서 자사 화물을 보관합니다. 이 창고의 역할은 '보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화물의 통관과 검역, 포장, 라벨링, 국내 운송 등 화물이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까지 창고에서 하게 되는 건 물류비 절감 차원이 큽니다. 각 작업이 다른 곳에서 이뤄진다면 화물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고, 처리 시간과 비용도 더 들게 됩니다. 창고에서 원스톱으로 이런 작업이 이뤄지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화물의 현재 위치, 동선, 처리 과정 등을 화주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창고 내 무인 자동화 로봇시스템(AGV) 등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외벽과 지붕 이외의 시설 최소화 되면서 구조 단순화
남아있는 건물들 리모델링 거쳐 문화거점으로 이용되기도
인천아트플랫폼, 문화 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한 대표 사례
창고 건물은 구조가 단순합니다. 외벽과 지붕 이외의 시설은 최소화됩니다.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물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쌓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건물도 많습니다.
개항 이후 많은 창고가 지어지고, 쉽게 헐리기도 했습니다. 그중 최근까지 남아있는 창고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이 대표적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창고 건물을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구도심 재생사업 일환으로 2009년 인천아트플랫폼을 개관했습니다. 대한통운이 이용하던 창고 건물 2개 등 옛 건물들을 활용했습니다.
이들 창고 건물에선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부턴 코로나19 때문에 전시·공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전엔 연간 10만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기도 했죠. 단순한 건물 구조가 전시와 공연 같은 문화 관련 작업을 하는 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인천 내항 8부두 곡물 창고도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적 1만2천150㎡, 길이 270m, 너비 45m의 이 창고는 내부 기둥이 없는 단일 공간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인천항 제2선거 건립과 연계해 1975년 정부 주도로 건립됐죠. 최대 5만t의 양곡을 적재할 수 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창고가 비어 있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인천 남항과 북항 등이 조성되면서 활용도가 낮아졌고, 2015년부터 내항 8부두 일부가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창고 기능을 잃게 됐습니다.
이 곡물 창고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상상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최근 시공사가 선정됐는데,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창고는 시대에 맞게 기능을 변화하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경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