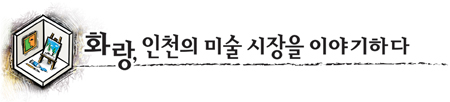인천의 미술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회화·조각·판화 등의 미술품을 사고파는 국제 규모의 아트페어인 '인천아시아아트쇼'가 최근 첫선을 보였으며, 지역의 크고 작은 갤러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리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시각예술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판매해 다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건전한 '미술 시장'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척박한 지역의 미술 시장에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힘써온 지역의 화랑 운영자들에게 인천의 미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편집자주

화랑(갤러리)은 관람객과 창작자와 만남을 맺어주는 전시 공간이면서, 또 창작자인 작가(생산자)와 콜렉터(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미술품 유통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해반갤러리는 인천에서 최초와 다름없는 화랑이다. 30년 전 인천 동구 송림동 60-75, 이흥우치과 건물 2층에 서양화가 최정숙(67) 작가가 문을 열었다. 1991년 6월 개관 기념 12인전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활발하게 운영되다 지금은 전시 공간은 없고 사업자등록만 남아있다.
그가 구도심인 동구 송림동에 전시 공간을 마련한 이유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는 "전시 공간이 없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0년 전에는 전무 하다시피 했다"며 "전시를 통해 관객과 만나서 관객에게 미술 작품을 팔아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지역작가 작품 소개 공간 부족하다 느껴
30년전 송림동 건물에 개관 12인전 열어
그는 지역 작가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정작 자신의 작품활동은 접어두고 화랑 운영자로서의 활동에 집중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크고 작은 기획전시를 이어갔다. 시간이 나면 서울의 전문 화랑과 교류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시가 관람객의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다. 작가의 지인이나 최 관장의 지인이 사는데 그쳤다. 구도심을 벗어나도 소용이 없었다.
1993년에는 당시 재력이 있는 이들이 많이 산다는 부평현대백화점 인근으로 분관인 '해반갤러리 부평점'을 만들었지만 그 곳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익은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그는 결국 2년 만에 분관을 닫았다. 결국 송림동의 해반갤러리도 2003년 이후 이렇다 할 전시 없이 운영을 접고 이름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다.
"창작활동에 도움되는 구조 만들고파"
임대료 감당 못 해 문닫고 이름만 남아
인천아시아아트쇼 시민 호응 주목해야
최 관장은 시장을 만들지 못한 실패의 원인을 "물을 주지 않아서"라는 말로 요약했다. 그는 "미술품을 사고파는 시장이라는 싹을 틔우려면 누군가가 저변이라는 '물'을 주며 가꿔야 하는데 아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시립미술관조차 하나 없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그는 "전시장에서 그림을 자주 접하고, 자주 감상하다 보면 또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작품을 구매하는 미술 저변을 넓히는 일을 사실상 민간에만 맡겨둔 셈이었다"면서 "싹이 자라고 꽃이 피우도록 물을 주고 가꾸지 않은 공공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 돌이켜보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열린 '2021 인천아시아아트쇼' 현장 입구에 길게 늘어선 관람객의 모습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만큼 시민들이 목말라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면서 "이 기회를 다시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