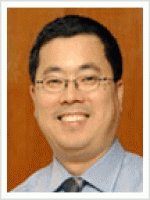지난주 구광모(43) 회장이 이끄는 LG 그룹이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임원 명단을 보니 40대가 62%나 됐다. 그룹 전체 임원 중 1970년대생 비율은 지난해 41%에서 52%로, 11%P 올라 절반을 넘었다. 지주사인 (주)LG도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 임원들이 포진했다. 재계는 '젊은 총수이기에 예측은 됐으나 파격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삼성전자 임원 인사도 30대, 40대 약진이 두드러진다. 30대 4명이 상무로, 40대 8명이 부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직급과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를 내고 잠재력을 갖춘 인물을 과감하게 발탁했다고 한다. 삼성은 지난달 직원들의 직급별 체류 기간을 전면 폐지해 30대 임원, 40대 최고경영자(CEO) 탄생을 예고했다.
SK그룹은 1975년생 노종원 부사장을 주력사인 SK하이닉스 사장에 임명했다. 지난해엔 1974년생 추형욱 SK E&S 사장이, 지난달엔 1970년생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승진 발탁됐다. 지난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임원 인사에선 상무 승진자 3명 모두가 1970년대생이다. 코오롱그룹도 지난 10월 신임 상무보 21명 중 40대가 18명(85%)이다.
올해 연말 주요 대기업 정기인사의 특징은 세대교체 바람이다. 40대 CEO가 대세이고, 30대들이 임원 자리를 꿰차고 있다. '연공서열이 아닌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중용하자'는 게 메인스트림(Mainstream)이다. 3세대, 4세대 경영시대가 열리면서 총수들 나이가 낮아진 것도 세대교체를 당기는 촉매제가 됐다는 평이다.
세대교체뿐 아니라 오너(Owner)=총수 등식도 깨지고 있다. 두산그룹 3세 경영인 박용만 두산경영연구원 회장은 이달 초 두산그룹을 떠나 봉사활동과 구호사업에 전념하기로 했다. 아버지를 보좌해온 아들 박서원 오리콤 부사장, 박재원 두산중공업 상무도 함께 떠난다. 두 아들은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고 한다.
미국을 다녀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니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후 60대인 최고 경영진 3명이 모두 퇴진했다. "두렵다"는 심경을 밝힌 최태원 SK 회장은 40대 CEO들을 전면 배치했다. 두산그룹 총수가 쿨(Cool)하게 물러났다. 재계의 변혁(變革)을 알리는 전조들이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