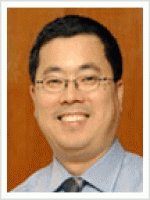수도권 관문 인천은 1981년 7월1일 광역시(당시 직할시)로 승격했다. 당시 인구는 114만명. 정부는 인천의 인구가 100만명을 훌쩍 넘기자 부산·대구에 이어 3번째로 '직할시' 명칭을 부여했다. 경기도에서 분리돼 자치 역량을 키운 인천은 승격 40년 만에 거주 인구 300만명을 넘어서고, 연간 예산 18조원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전국 6개 광역시 중 막내인 울산은 1997년 7월 승격됐다. 당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101만3천명.
수도권이 팽창하면서 2010년대 말 수원·고양·용인, 마산·진해·창원이 통합한 창원이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다. 덩치가 커진 4개 지자체 시민과 단체장들은 광역시 승격을 요구하고 나섰다. 높아진 위상에 맞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는 달갑지가 않다. 인력, 조직, 예산 규모가 커지고 일정 부분 권한도 넘겨줘야 한다. 고민 끝에 나온 묘안이 '특례시(特例市)'란 꼼수다.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 명칭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 정도의 절충 개념이다.
수원·고양·용인이 내년 1월13일 특례시로 승격한다. 정부나 경기도 승인, 허가가 필요했던 일부 사무에 권한이 확대되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율성이 커진다. 중앙정부 86개 기능과 383개 사무, 경기도 8개 사무가 이관된다.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한 폭넓은 권한이 눈에 띈다. 위상이 높아진 만큼, 조직과 인력 규모도 늘어난다. 특례시 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달라질 전망이다.
온도 차이는 있으나 해당 지자체 반응은 긍정적이다. 완전체가 아닌 불안정한 형태에, 불완전한 권한이란 불만보다는 새 출발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크다. 일단 해보고 부족하면 그때 다시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다.
오랜 산통 끝에 특례시가 출범하게 됐으나 난제가 산적하다. 기초도 아니고 광역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이다. 경기도와 특례시와의 관계 설정이 애매하다. 지방자치법상 인구수에 상관없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다. 50만 넘어 100만에 근접한 도시가 수두룩하다. 특례시가 많아지면 광역지자체 역할에 의문이 커질지 모른다. 600년 이어진 행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기형아'가 탄생했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