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를 벌인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34만명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30만명)·일산서구(29만명)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성립하는 건 인구는 물론이고 독자적인 영토, 고유 문화와 같은 개별성이 담보될 때라고 합니다. 단순히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 만으로 독립적인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인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활동하는 프로축구 선수는 100명 정도로, 22명이 스쿼드를 이루는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선 5배 가량 되는 전체 프로 중 대표를 선발해야 합니다. K1리그만 12개 팀이 참여하고 아래 K2·K3·K4 리그 등을 두고 있는 한국과는 선수 풀(pool)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5천184만명 인구를 지닌 세계 인구 순위 28위의 국가입니다. 바로 위에는 미얀마(27위·5천522만명)가 있고 아래에는 콜롬비아(29위·5천151만명)가 있습니다.
전체 국가 중에선 인구가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은 통계에 따라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 중 20위~30위권 사이를 오갑니다.
인구 천 만을 넘나드는 메가시티는 그 자체로 어떤 한 국가와 비슷한 복합체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서울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수원시(118만명), 고양시(107만명), 용인시(107만명) 등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손꼽힙니다. 인구가 몰린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과거 마산·진해·창원을 통합한 창원시가 103만 인구로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죠.
광역 지위를 가진 제주도의 인구는 67만명입니다. 인천(293만명)·부산(335만명)처럼 큰 규모의 인구를 자랑하는 광역시도 있지만, 울산(112만명)·대전(142만명)·강원도(153만명)처럼 수원·고양·용인과 엇비슷한 규모를 보이는 광역시·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황하게 인구 이야기를 늘어놓은 건 인구가 곧 행정 권한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시군, 광역단체比 적은 권한
행정서비스 품질 하락 결과 초래
경기도 3개 市 '특례시' 지위 획득
쉽게 공무원 숫자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권한의 정도에서 광역시도와 일반 시군의 차이는 큽니다. 즉, 인구가 적더라도 광역시도의 지위를 지닌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비해 일반 시군은 권한이 적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많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단순한 민원을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어디에 거주하는 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국가입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는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결정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1991년 지역민의 선거로 지방의회가 선출됐고, 1995년 시장·군수와 같은 단체장을 직접 선출했으니 이미 30년 가량 지방자치를 시행해 온 셈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광역 자치단체-기초 자치단체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여전히 지역이 지역의 일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좁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려 해도 광역시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이 내딛어졌습니다. 바로 '특례시' 출범입니다.
우리에겐 낯선 용어인 특례시는 바로 수원, 고양, 용인과 같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형 기초자치단체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수원시민, 고양시민, 용인시민은 각각 수원특례시민, 고양특례시민, 용인특례시민이 됐습니다.
9종 복지급여·8종 사무권한 확대
지방자치 실현에 한발 더 내딛어
"실질적 권한 추가 확보" 입장도
이들은 이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되 광역시급에 준하는 자치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긴급복지·기초연금 등 9종의 복지급여 선정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고 기존 도가 처리하던 8가지 사무권한도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도지사 사전협의를 통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을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행정 용어이고 이런 조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특례시들은 이런 조치 외에도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특례시가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즉, 특례시 지정은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경기도에는 모두 3개의 특례시가 생겼습니다. 추후에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특례시로 추가 편입될 수 있습니다. 특례시는 특례시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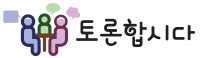



![[이슈추적] 교육계 안팎 전 구성원 실태점검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27/news-p.v1.20250427.14bce90e6c954fda890b8cb39d8c46c5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