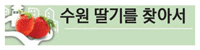한때 수원은 딸기의 고장이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수원 노송지대, 푸른지대 일대는 딸기밭 일색이었고 봄철 딸기 맛을 보기 위해 수원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었다. 첫 국산 딸기 품종인 '대학 1호'가 만들어진 곳도 수원이다.
지금은 '대학 1호'보다 더 달고 단단한 국산 딸기 품종이 다수 탄생했고 주 생산지 역시 충남과 전남, 경남 등으로 옮겨갔다. 딸기 대표 도시라는 명성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딸기 꽃은 피고 있다. 세 편에 걸쳐 수원 딸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한다. → 편집자주
수원의 경계를 조금 넘으니 그의 농장이 있었다. 1천155㎡ 남짓한 땅의 상당부분을 비닐하우스가 차지하고 있었다. 하우스에 들어가자 딸기 향이 났다. 베드 시설을 통해 수경재배를 하는 일반 농장들과 달리 딸기는 줄줄이 흙에 심어져 있었다.
"이건 금실이고, 이쪽은 고슬이라고 신 품종이에요. 생긴 게 조금 다르죠?" 알알이 맺힌 딸기를 수확하는 양재철(73) 행복농원 대표의 손놀림에 기쁨이 묻어있었다.
양 대표는 "지난해에 딸기 농사가 전반적으로 잘 안 됐었다. 올 초에 딸기 값이 치솟지 않았나. 우리도 3분의2가 죽었었다. 심을 맛이 도저히 안 나더라.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다시 마음을 잡고 한 게 이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농사 실패에도 마음 다잡아
수원농협서 유해충 천적농법 지원

청년 시절 4H 운동 등 농촌 근대화 운동에 매진하기도 했지만, 청춘의 대부분은 기업에서 보냈다. 누구보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1974년 무렵 수원에 있던 직장 동료 아버지의 딸기밭에 갔던 순간이 왜인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은퇴 후 사회복지사 공부에 전념하다 한국농수산대학을 찾은 것도, 언젠가는 딸기 농사를 짓고 싶다는 젊은 시절 꿈이 한몫을 했다. 농산물 가공, 도·농 교류, 친환경 농법 등 다양한 공부를 거쳐 딸기 부문만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유하고 있던 농장 한쪽에 딸기를 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빨간 딸기가 맺힌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딸기 농사를 키워갔다. 함께 공부하면서 딸기 농사에 관심을 가진 이들과 수원딸기연구회를 꾸리기도 했다.
양 대표는 "지금은 과학 영농 시대다.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몸소 체험하며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딸기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꾸리게 됐다. 화성딸기연구회도 만들어졌다"고 부연했다.
노하우 공유하려 연구회 꾸리기도
"과학영농 교육·지원 활성화 바람"
수원농협의 도움도 적지 않게 받았다.
양 대표는 "딸기가 고소득 작물이지만 키우기가 쉽지 않다. 이 하우스에도 정말 많은 노하우들이 집약돼있다. 베드 시설을 할 수도 있지만 토경 재배를 통한 친환경 딸기를 고집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원농협에서 친환경 천적 농법(딸기 유해충을 천적으로 방제하는 방식)을 지원받은 게 도움이 됐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딸기 성장을 돕는 미생물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농사를 접으려다가 그런 점 때문에 마음을 다시 먹은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농사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과학 영농에 도전할 수 있도록 농업 마이스터대 교육이나 친환경 천적 재배 지원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뿐 아니라 함께 딸기 농사를 짓고, 연구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꿈은 한때 딸기의 도시였던 수원의 명성을 되찾는 것이다.
양 대표는 "딸기는 원래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에서 한국 딸기에 관심이 많다. 노력의 결과"라며 "딸기 농사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힘을 보태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딸기를 재배하면 언젠가 푸른지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