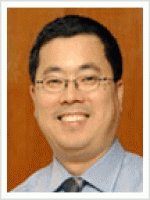진드기 사촌 격인 응애는 다른 거미류와 달리 기생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식물에도 기생하고 척추동물, 무척추동물과도 기생 관계다. 생존력이 뛰어나 모양과 크기, 서식지가 다양하다. 3만종 넘는 응애류가 지구촌에 분포하며, 끊임없는 종분열로 신종 개체군이 계속 번성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응애는 대체로 인간에 해롭지만 이로움을 주기도 한다. 농작물이나 가축에 기생해 손해를 끼치고, 병원체를 옮기는 나쁜 매개가 된다. 뽕나무응애, 사과응애는 과수농가들에 골칫거리다. 동물 기생의 일종인 꿀벌응애는 꿀벌을 숙주로 체액과 조직을 먹고 자란다. 암컷은 몸길이 1천120㎛, 폭 1천686㎛에 불과한 미물이나 양봉 농가들에 큰 피해를 준다. 반면 식물을 분해해 영양물질의 순환에 도움을 주고,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을 섭취하는 익충 역할도 한다.
올 들어 남부지방에 꿀벌들이 사라지는 일이 확산하고 있다. 봄철을 맞아 꿀벌 깨우기를 하던 양봉 농가들은 망연자실한 표정들이다. 제주와 남부에서 시작된 꿀벌 실종사건은 충청과 강원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게 농촌진흥청 관찰 결과다. 전국적으로 77억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순으로 피해가 컸고 충남과 강원, 경기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은 전체 농가의 75%가, 경북은 절반 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농진청은 꿀벌 실종사건의 원인으로 꿀벌응애와 말벌에 의한 대량 폐사, 이상 기후에 따른 요인이 복합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피해지역 대부분 벌통에서 응애가 관찰된 점에 주목한다. 예찰이 어려운 응애류의 발생을 농가에서 인지하지 못해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월동하는 일벌 수가 급감했다는 거다. 지구온난화로 동면해야 하는 벌들이 12월에도 야외활동을 하다 체력이 소진하면서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꿀벌은 2㎝도 안 되는 작은 곤충이나 가축으로 대우받는다. 양봉 농가뿐 아니라 과수업계에 이만한 효자가 없다. 나비와 함께 식물의 꽃가루를 옮겨 수정을 돕는다. 2억2천만년 전부터 한반도 전역 동·식물 번성에 관여했다. 천적인 응애의 등쌀에, 이상 기후로 인해 멸종할 위기에 놓였다. 꿀벌 실종사건은 자연 생태계를 무너뜨릴 대재앙의 전조(前兆)일지 모른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