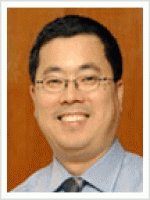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빗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매라"(원문인용). 월산대군은 조선 9대 임금 성종의 형이다. 간신배들 농간으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강호에 스며들었다. 가을날 달 밝은 밤에 배를 띄우고 낚싯대를 던졌으나 야속한 고기는 끝내 입질이 없다. 아쉬움을 달래며 낚싯대를 걷고 빈 배를 저어 돌아온다. 비록 빈 손이나 추강(秋江)의 풍류를 즐겼으니 이만하면 좋지 아니한가. 비운의 월산은 목숨을 부지하려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했으나 서른다섯 이른 나이에 생을 다하고 말았다.
어린 시절 냇가에서 친구들과 놀던 추억은 동심을 떠올리는 아련한 풍경화다. 시골 아이들은 족대로 잡은 피라미, 붕어, 메기로 허기진 배를 달랬다. 국수나 수제비를 넣어 양을 늘렸다. 여름 저녁 다슬기를 잡아 된장국 끓여 먹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옷핀으로 알맹이를 빼먹었다. 떡메에 작살로 무장한 동네 청년들은 첫 얼음 언 개울에서 팔뚝만큼 큰 잉어며 메기를 잡아올렸다.
현실 속 민물 어부의 삶은 고달프다. 어패류 자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판로마저 여의치 않다. 경제적 보상이 따르지 못하면서 힘든 일상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어장을 떠나고 있다. 값싼 외국산 수입물에 밀려 제값을 받기 힘든 유통구조다. 나이는 먹어가고, 하루가 다르게 근력이 떨어지는데 그만둘 수도 없는 안쓰러운 처지들이다. 가업을 잇겠다는 핏줄도, 젊은이도 보이지 않는다.
2019년 말 현재 전국 내수면 어부는 6천622명에 불과하다. 70%는 50줄 넘은 연령층이고, 20대는 8%에 그친다. 벌이가 시원치 않아 농사일과 운전 등 겸업을 하는 어부가 열 중 여섯을 넘는다고 한다. 4천442명은 어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한때 100여 명이 생업을 잇던 평택호 어부는 41명으로 줄었다. 경기도 내 내수면 어부는 1980년 3천363명에서 2020년 1천141명으로 감소했다.
임진강의 명물 민물장어와 참게, 평택호의 붕어와 가물치, 한강 잉어와 누치, 다슬기는 씨가 마르고 있다. 빈 그물에 실망한 어부들이 강과 호수를 등지고 있다. 월산대군은 빈 배를 저으며 풍월(風月)을 읊었는데, 민물어부의 그물엔 근심만 가득하다. 어부들의 비가(悲歌)마저 끊기게 될 지경이 됐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