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福祉)는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전체 예산 33조6천억원의 40%인 13조4천억원을 사회복지 사업에 투입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는 현재 '선별'과 '보편' 지원이란 두 갈림길에 서 있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보편 복지는 지원 대상이 넓어 혜택을 받는 도민이 많아 전체적인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지원한 만큼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인구가 꾸준히 늘고,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사는 경기도는 더 많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두 가지 방향성이 충돌하고 있는 처지다.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분배해 돕는 선별 지원은 전통적인 복지 패러다임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대표적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인구가 늘수록 선별성 지원에 대한 예산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기 마련이다. 지난 2015년 78만4천명이었던 도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108만9천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도 2015년 25만7천명에서 2019년 32만8천명까지 늘었다.
더군다나 경기도는 청소년 부모, 한부모 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에게도 지원 사업을 넓히며 선별 영역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취약층 예산집중 고령화로 큰 부담
기본소득 등 사업 확대 목소리 커져
"대상·범위 등 우선순위 설정 필요"
반면 자격과 조건 없이 모든 대상자를 지원하는 보편 복지도 사업 확대 수요가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선 7기부터 '도민이 낸 세금을 도민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슬로건이 바람을 타며 청년, 농민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이 자리를 잡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모든 도민에게 2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지원이 실제 도민의 생계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하며 보편 지원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민이 바라는 복지정책' 이슈진단 보고서를 발간한 경기연구원은 돌봄과 주거 등 도민 삶 전 영역에 걸쳐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도민의 복지 정책 혜택과 지원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상과 지원 범위 등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해야 도민이 원하는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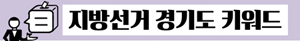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2) 수도권 규제] 지방 대신 해외 나가는 기업들… 국토 균형발전 명분 잃은 희생](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5/20220517010003878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