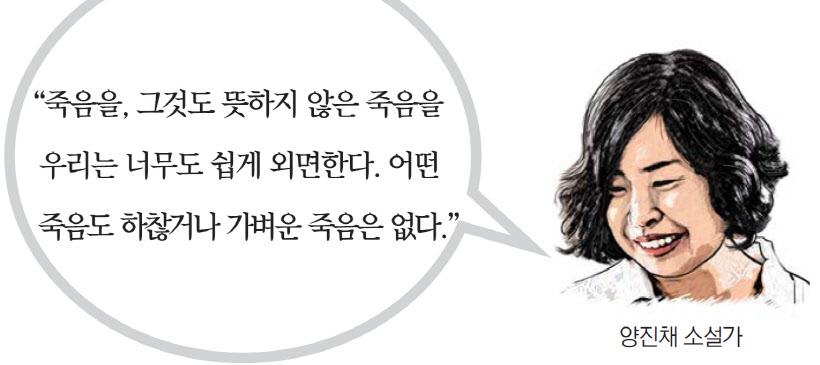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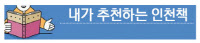

1999년 10월 학교 축제 기간이었고, 이른 저녁 호프집 지하에 불이 났다. 아이들은 화재를 피해 건물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지배인은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을 막았다. 화재 30분 만에 57명이 사망했다.
사회는 미성년 아이들이 호프집에 갔다는 이유로 죽음을 악의적으로 몰고 갔다. 인현동 화재 사고. 이 사건의 방점이 대피하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경찰과 결탁한 악덕 사장이 아니라 호프에 찍혔다.
1999년 30분만에 아이들 57명 잃어
문잠근 사장보다 불건전 죽음 매도
공간부재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세워
아이들이 술집에 갔다는, 건전하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죽음을 매도했다. 학생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없었다는 반성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세워졌지만 위령비는 눈에 띄지 않는, 발길이 뜸한 주차장 옆에 마련돼 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었다. 아이들, 아이들의 부모, 친구, 선생님, 인천 시민. 죽음을, 그것도 뜻하지 않은 죽음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외면한다. 어떤 죽음도 하찮거나 가벼운 죽음은 없다. 살아남은 자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채 꾹꾹 눌러 덮는다.
김금희 소설가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 주인공 경애와 상수는 그 화재 사고로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 경애는 그 사고의 생존자이기도 하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모른 채 팀장과 직원으로 만난다. 둘은 언뜻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듯하지만 그때의 상처는 치료되지 못한 채 불쑥불쑥 쓰라리다.
'그러자 그렇게 가볍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상수의 마음에서 통증이 생겨났다. 어디 한군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산발적으로 마음 곳곳에서 느껴졌다. 나중에는 텅빈 곳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꽉 차게 아팠다.'
과하지 않게 꾹꾹 눌러 쓴 문장들
불쑥불쑥 통증 환기 외면해선 안돼
인천, 끝 아닌 시작으로 서로 경애
소설은 꼭꼭 눌러 읽게 된다. 단단한 문장을 짚어가는데 우리 마음은 자주 흔들린다. 작가가 주인공에게, 혹은 독자에게 건네는 위로의 방식이 섣부르지 않고 과하지 않고 따뜻해 눌러놓았던 상처 입은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마음을 폐기하지 마세요. 마음은 그렇게 어느 부분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부스러지기는 했지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강변북로를 혼자 달려 돌아올 수 있잖습니까.'
어떤 상처는 나았나 싶어도 어딘가 꼭꼭 숨어 상처를 덧낸다. 깊숙이 박혀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통증을 환기한다. 우리는 이 환기를 외면하려 한다. 내가 아니라고, 내 가족이 아니라고. 누군가는 '머리를 감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하는, 누구나 하루에 한번쯤은 귀찮아도 후다닥 해내는 그런 일마저도 너무 무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회관 앞에 '기억의 싹'이라는 크지 않은 조형물이 세워졌다. 싹을 틔운 기억은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김금희 소설가는 부산에서 태어나 어릴 때 인천으로 왔다. 다른 소설에도 인천이 조금씩 등장한다. 이 소설에서 두 사람은 인천을 드러내는 이런 말을 한다.
"하기는 전철 끝이니까, 머니까."
"그쪽에서 보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도 한 거잖아요."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경애의 마음. 경애라는 말은 마음이 마음을 건널 때 가능한 말. 인천을 끝이라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우리 안의 시선을 갖는다면, 그 시작은 서로를 경애하는 마음이 아닐까.













![[내가 추천하는 인천책·(2)] 김윤환 서울연구원 연구원-김하운 '인천사람도 다시보는 인천경제 이야기'](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7/20220705010001760000075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