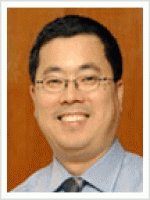민물 생태계 포식자 메기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에 두루 분포한다. 왕성한 먹이활동이 특징인데, 생존 본능도 뛰어나다. 가뭄이 들면 진흙에 몸을 숨기고 비가 올 때까지 버티기를 한다. 심장박동을 정지상태에 가깝게 줄여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한다. 곰들이 겨울잠을 자는 원리와 비슷하다.
아가미가 아닌 폐로 호흡하는 폐어는 극한 환경도 극복해낸다. 건기에 물이 마르면 하천바닥을 파 굴을 만든 뒤 수면상태에 들어간다. 점액으로 몸을 감싸 수분을 유지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최대 3년까지 생존할 수 있다.
메기와 폐어도 멸종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엔 산하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최근 보고서에서다. IPCC는 기후위기로 생태계의 미래가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해양생물 종은 1950년대 이후 10년마다 59㎞씩 북쪽으로 이동했다. 육상 생태계는 기온 2℃ 상승 시 생물 종 3∼18%가, 3℃ 상승하면 29%가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일 수 있다. 5℃ 상승하면 최대 60%가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부지방에서 사상 처음 6월에 열대야를 경험하는 기상 이변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저녁 6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울 최저기온은 25.4도로 열대야를 기록했다. 전날 24.8도로 25년 만에 가장 높았던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수원도 일 최저기온이 25.1도로 6월에 처음 열대야 기준을 넘어섰다.
열대야는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것을 말한다. 온대성 기후대인 한반도는 열대야가 많지 않았으나 온난화 영향으로 시기가 빨라지고 일수도 늘고 있다. 전국 연평균 열대야 일수는 1991~2020년 7일 가량이나 2010년대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서울은 연간 13일, 대구는 17일이나 발생했다. 2013년 서귀포에선 무려 49일간 열대야가 계속되는 진기록이 나왔다.
기상청은 올여름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봤다. 장마 시작도 전에 열대야가 먼저 왔다. 인간계의 무한 탐욕에 기상이 변이하고 생태계가 엉망이 됐다. 열대야가 물러나는 처서(處暑)까지 50일 넘게 남았다. 밤잠 설치게 됐다고 푸념할게 아니다. 경고음이 이상하지 않은가.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