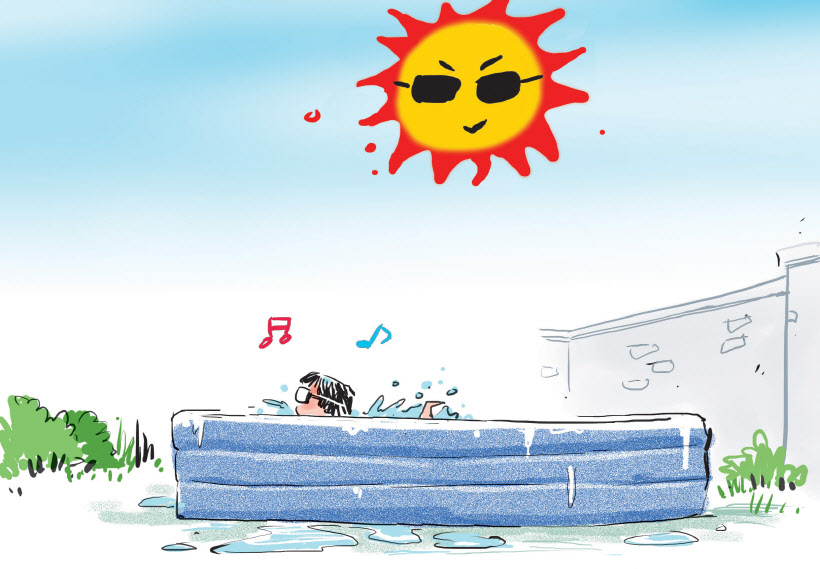

깊이가 일 미터 남짓한 간이 수영장에서 사방으로 물을 튕기며 즐겁게 첨벙거리는 딸을 보고 있으려니 내 글쓰기도 저렇게 즐거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나 역시 10매 가량의 글을 붙들고 있으면서 온 사방에 단어란 단어는 죄다 흩뿌려놓은 채 허우적거리다가, 멍하니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연주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이다. 17세 소년의 무서운 몰두를 보면서 오래가지 않는 반성의 채찍질을 한번 휘두르며, 억지로 종이 속에 뛰어든다. 아아, 수박이나 먹고 싶다….
시고모님이 펴낸 요리 산문집 도착
시어머니·둘째 고모의 엄청난 손맛
문득 한 권의 책이 도착한다. 시고모님이 내신 요리 산문집이다. 시를 쓰는 둘째 고모는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오고 목소리는 성악가같은 분으로 결혼 전에 시부모님보다도 먼저 만나 뵙던 분이다.
속초가 고향인 남편을 만나면서 서울토박이인 내게는 바닷길이 열린 셈이 됐는데, 그 길에 가장 먼저 떠내려온 것은 다름 아닌 음식이었다.
우선 홍게가 있다. 시아버지가 현역 선장님이던 시절, 나는 이 비싸고 귀한 홍게를 물릴 때까지 실컷 먹을 수 있었다. 백골뱅이와 소라는 덤이다. 그 외에 도치 알탕이며 도루묵조림, 총알 오징어와 가자미 식혜를 비롯해 난생 처음 먹어보는 물고기들, 온갖 나물과 해초무침, 이 모든 것을 제압하는 여왕같은 김치를 맛볼 수 있었다.
산과 바다에서 나는 싱싱하고 다채로운 식재료를 엄청난 손맛으로 요리하는 시어머니와 둘째 고모의 음식솜씨 때문에 제사 때마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고 가야겠다는 다짐 아닌 다짐을 하게 된다. 남편에게 반한 것도 사실은 남편이 해준 요리 탓이 크다. 그런데 책을 넘기니 그 요리의 근원이라고 할까, 맛있는 음식이 뚝딱 만들어지는 손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길이 보이고, 그 끝에 돌아가신 시할머니의 모습이 나온다.
'작가가 나온 집은 망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작가가 자기 집안사를 낱낱이 글에 써먹는다는 뜻이다. 시고모의 산문집을 읽으면서 그 말뜻을 얼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글자와 글자 사이에, 쉼표와 마침표 사이에, 책장이 넘어가는 사이사이에, 배추 포기에 양념이 배듯 고모 인생에서 드나들었던 삶과 죽음이 배어나왔다.
시할머니 모습… 책속에 근원 보여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의 맛 속에서
돌아가신 엄마 되살아나는건 뭘까
나로서는 기묘한 독서였다. 친척의 글, 아는 사람이 간간이 등장하는 글을 읽는 건 1인칭과 3인칭을 넘나드는 경험이었고 글과 삶의 중간에서 무인칭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이었다.
고모는 열세 살에 돌아가신 엄마의 손맛을 그대로 닮았고, 그 부재를 존재보다 더 크게 껴안고 사셨다. 서두에 적혀있기를, 엄마가 그리울 때면 시장에 가서 두 손이 무겁도록 장을 본다고 했다. 시장에 가면 '여러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장날에는 '더 많은 엄마들'로 불어나기 때문에 과하게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니 음식을 만드는 일은 내 손에 엄마의 손을 되살리는 일이며 포개놓는 일이 된다. 이렇게 혀와 코와 손으로 되살려놓은 엄마는 사라질 수 없으며 엄마를 되살리는 시간은 내가 열세 살로 돌아가는 시간, 혹은 백열세 살이 되어 엄마의 엄마가 되는 시간이다. 흐르지 않는 시간, 흐름에서 달아나버린 시간. 시간을 흔들어놓는 한이 있어도 되살려야 하는 엄마. 이 책의 제목은 '음식을 만들면 시가 온다'인데 '시'라는 글자에 '엄마'를 넣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았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의 맛 속에서 돌아가신 엄마가 되살아나는 것은 대체 어떤 경험일까? 요리라고는 떡볶이밖에 만들 줄 모르는 나로서는 읽던 페이지에 손가락을 끼워놓고 그저 상상할 수밖에.
/김성중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