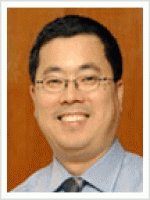예견된 참사다. 김용진은 기재부 요직을 두루 거쳤고, 호조참판(戶曹參判) 반열에 올랐다. 국회의원도 심기를 살피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지체 높은 자리다. 나라 곳간 열쇠를 쥔 힘 있는 부처 관리가 을(乙)의 심정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터이다. 중앙부처 고위 인사가 서울 변방 지자체의 지방의원들을 대면할 기회도, 이유도 없었을지 모른다. 을의 얼굴로 중재를 자임했으나 과한 취기에 그만 자제력을 잃었다. 축적된 버릇은 저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道 최고위 간부·시군 부단체장 거의 제자리
인사 흔들리면 조직 붕괴 뒤엉킨 타래 풀어야
지난달 말 경기도청 인사안을 보다가 멀쩡한 눈을 의심했다. 민선 8기 첫 사령임에도 최고위 간부들은 아무도 바뀌지 않았다. 행정1·2 부지사 모두 유임됐고, 실·국장들도 자리를 지켰다. 도지사 사진만 바꾸면 새 조직도가 필요 없을 듯하다. 신정부가 출범했는데 총리에 부총리, 장관들이 죄다 유임된 것과 다르지 않은 괴이한 일이다. 행정1 부지사는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 출마로 7개월 넘게 지사직 권한대행을 지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도청 인사가 꼬이면서 시·군 부단체장 인선도 엉켰다. 50만명 이상 대도시 부단체장은 전원이 제자리다. 부임지에서 3년을 훌쩍 넘긴 부시장이 수두룩하다. 소속 정당이 바뀐 지역의 단체장들은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과 동거를 하게 됐다'며 불편한 기색이다. 조율에 실패한 광명·구리 부시장은 공석으로 남았다. 큰 집과 맞서다 엄마 없는 결손가정이 된 꼴이다. 경기도는 조직안정을 위한 인사라는데, 시군에선 이처럼 황당한 적이 없다고들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초반 체면을 구겼다. 인수위 부위원장에 경제부지사로 발탁한 복심(腹心)은 만신창이가 됐다. 첫 단추를 푼 본청 인사는 윗도리는 놔두고 아랫도리만 바꿔 입은 모양새다. 기초단체장들은 "퍽퍽한 고구마 인사에 속이 답답하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여야 동수인 도의회는 감투싸움을 하다 전국에서 가장 늦게 개원하는 진상이 됐다. 아귀다툼에도 김 지사는 원칙이 먼저란다. 덕분에 1조4천억원 추경 보따리는 풀어보지도 못하고 여름을 나게 됐다. 전국 공기업마다 개혁에 물갈이로 떠들썩한데, 경기도만 조용하다. 전(前) 지사 사람들이 건재한 도(道)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세상이 바뀌기라도 했느냐'고 되묻는다.
"도의회·야당·기초단체 먼저 챙겨야 한다…
무조건 양보·소통하라" 허투루 흘릴말 아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가 '일머리'는 키웠으나 정무 감각은 퇴화한 것 아니냐고 한다. 현안을 돌파하려는 결기와 추진력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장점이라는 유연함은 우유부단으로 치환된다. 대(對)의회 관계는 누가 대신할 수 없다. 집행부 수장이 선봉장이다. 인사가 흔들리면 조직이 무너진다. 광명·구리 시장과 만나 뒤엉킨 타래를 풀어야 한다.
이재명 전 지사는 취임 즉시 하천과 계곡을 돌며 불법과 맞짱을 떴다. '인파이터'의 독한 결기를 본 직원들도 밤낮없이 뛰었다. 단발성 전시용이 아님을 눈치챈 업주들은 평상을 자진 철거했다. 초식(草食)인 남경필 전 지사는 자당(自黨)의 우위에도 연정을 제안했다. 부지사는 야당 몫이었다. 김 지사는 '나는 남경필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라고 한다. 출항한 지 달포가 넘었는데 '김동연의 항로'는 선명치 않다.
"중앙부처는 머리로 (일)하지만 지방행정은 가슴으로 하는 거다. 정부정책이 주민에게 스며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초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마음으로 다가서고 부지런히 발로 뛰어라". 경기도와 행안부를 거친 공직자의 조언이다. 그가 덧붙였다. "국회보다 도의회를, 여당보다 야당을, 중앙부처보다 기초단체를 먼저 챙겨야 한다. 무조건 양보하고 소통하라". 허투루 흘릴 말이 없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