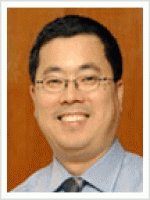1970년대까지 한국은 만성적인 쌀 부족 국가였다. 정부는 단위 면적당 소출량이 많은 품종을 대량보급하는 시책을 밀어붙였다. 농촌진흥청이 개량한 통일벼는 다수확 품종이나, 냉해에 약하고 맛도 떨어져 농가에서 파종을 꺼렸다. 정부는 농촌 면서기들을 악역으로 세웠다. 식감은 좋으나 소출이 적은 품종을 심은 논은 죄다 뭉개고 통일벼를 심도록 독려했다. 당시 시골 공무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 출장을 다녔고, 휴일도 반납했다. 한여름엔 조석으로 담당 부락(部落)에 들러 퇴비 증산을 다그쳐야 했다.
80년대 들어 상황이 확 달라졌다. 품종 개량과 농기계 보급으로 생산량은 늘어났으나 소비량이 줄면서 쌀이 남아돌게 된 것이다.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밥의 존재감이 옅어졌다. 주식이 밥인지, 빵인지 헷갈리게 됐다. 80년대 중반엔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됐다. 산아제한이 출산장려로 바뀐 것과 맞먹는 대사건이다. 88년부터 벼 재배 면적이 매년 감소했으나 잉여 쌀은 증가 추세다. 2020년엔 기상이변으로 유례없는 흉작이었으나 쌀은 여전히 처치 곤란한 난제로 남았다.
정부·여당이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의 쌀을 수매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생산된 쌀도 사주기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 매입을 위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쌀 공급 과잉을 심화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농심(農心)은 붙잡되 야당과의 기싸움에선 밀리지 않겠다는 정략에서다.
유례없는 인플레 폭주에도 쌀값은 올 들어 25%나 급락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8천여억원을 들여 쌀 37만t을 추가 매입했으나 지난해부터 이어온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 2000년 93.6㎏에 달하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9㎏으로 반토막이 났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시장에서 쌀을 격리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비관론이 커지는 이유다.
유발 하라리는 명저 '사피엔스'에서 농업혁명의 진정한 승자는 인간이 아닌 작물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식량 확보를 위해 곡물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거두느라 인류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논리다. 벼는 열매를 내어주는 대가로 번창했으나 한반도 남부에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