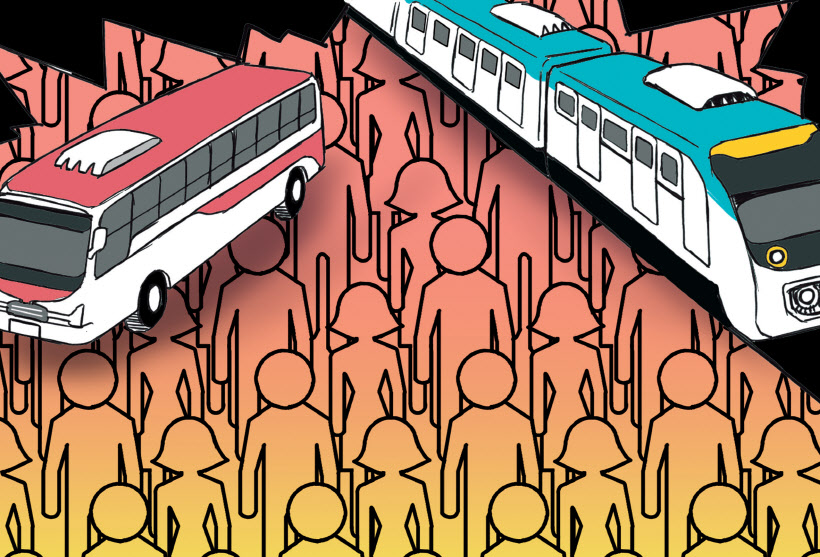
70, 80년대 추석이나 설 때면 대도시 극장엔 명절 대목에 맞춰 개봉한 영화를 관람하는 인파로 장사진이 펼쳐졌다. 당연히 일찌감치 줄서지 않으면 표를 구할 수 없었고, 표를 다 판 극장은 '만원사례(滿員謝禮)'를 내걸고 매표소를 닫았다. 정작 객석을 꽉 채운 손님들이 아니라 매표에 실패해 낙담한 사람들 앞에 내걸렸으니, 감사보다는 사과에 가까웠던 것이 '만원사례'의 아이러니다.
분단문학의 거장 이호철이 동아일보에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를 연재한 때가 1966년이다. 이 시절에 태어난 세대들은 어딜가나 '만원사례'인 과밀시대를 관통했다. 출퇴근, 통학시간대 만원버스들은 문도 닫지 못한 채 어린 차장들을 매달고 질주했다. 막차가 끊기고 통행금지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브리사, 포니 택시에 예닐곱명이 아무렇지 않게 합승했다. 어린이날이면 동물원이었던 창경원이 돗자리 깔 자리도 없이 붐볐고,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했다. 통금이 풀린 새해 전야엔 타종행사가 열리는 보신각 주변을 중심으로 사람 파도를 타고 종로로 명동으로 휩쓸려갔다.
과밀시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든든한 배경이었다. 값싼 노동력으로 산업을 일으켰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전쟁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에 헌신했다. 만원버스를 타고, 콩나물 교실에서 공부했던 베이비붐세대는 부모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다. 산업현장으로 향했던 인파가 독재정권에 맞서 해일처럼 일어나 민주화도 이루어냈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전쟁세대와 전후 베이비붐세대의 과밀의 피로를 온몸으로 감수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인간적인 공간을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생때같은 자식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과밀시대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만원(滿員) 위험 구역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광역버스와 전철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김포 경전철을 체험 승차했다가 혼쭐이 났다. 하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묘연하다. 부모 세대가 시달린 만원 버스를 자녀 세대가 지옥철로 이어받는다면 선진국의 의미가 애매해진다. 만원 버스와 전철에서도 비극이 싹트는 중일 수 있다. 이제 '만원(滿員)'은 위기의 징조다.
/윤인수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