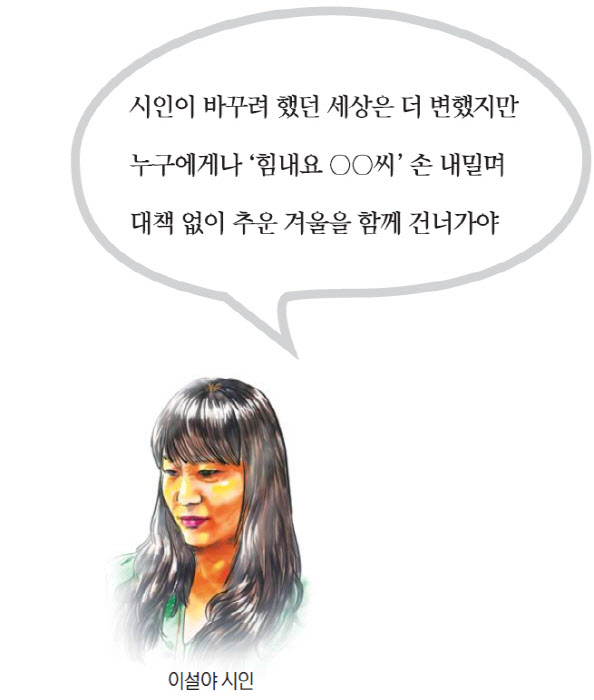

한참 후 1995년 제2회 실천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해 시인이 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늘 바빴고 드문드문 발표한 시들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또 한참 후, 2017년 등단 22년 만에 출간한 첫 시집 '너무 늦은 연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너무 늦게 도착한 그의 연서(戀書)인, 첫 시집에는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상처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다. 그는 우리가 통과해 온 거대 담론의 시대를 '그때 내 맘에도 / 많은 빛들이 살았'다고, '끝끝내 지키고 싶은'(너무 늦은 연서) 빛이자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모두에게 잊힌 한 혁명가'를 생각하며 '무엇이 끝났고 또 / 무엇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다시 잠 못 드는 밤에)지 묻고 있다. 첫 시는 '자화상-家系'로 시작한다. '소 힘줄 같은 고집과 / 힘줄의 탄력만큼이나 질긴 / 가난한 내력'은 그를 '삶의 게릴라', '운명과의 싸움꾼'으로 만들었다.
2017년 등단후 22년만에 첫 시집
고교 다니며 도시적 감수성 생겨
문청시절 시인·평론가와 어울려
그는 1963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지만 돌 전에 인천으로 올라왔다. 줄곧 서구 석남동에서 살았는데 당시 그곳은 시골 마을이었다. 그가 도시적 감수성을 갖게 된 것은 제물포고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다. 학교 담장을 넘으면 자유공원이 목전에 있었고, 비둘기집 아래로 인천항이 보였다.
차이나타운과 홍예문을 넘나들며 각국 조계지의 이국적 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다. 학교 주변에 펼쳐진 도시의 그림자와 이국 정서는 그의 내면으로 스며들었고, 시인 특유의 감수성을 만들어주었다. 그는 학교보다는 학교 밖을 배회하면서 성장통을 겪은 듯하다.
정거장은 어김없이 차를 세웠다. 62번 버스는 재빠르게 나를 뱉어 냈고 나의 발은 자유공원 쪽으로 길을 잡았다 문구용 칼로 새긴 문신만큼 엉성하고 그 칼날 끝에 묻어나던 핏물처럼 선명한 10대의 기억이 지하도 입구로부터 연기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중략)
거리에서 주워든 기억들은 방심한 가슴에 작은 물길을 내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 같은 것 그 거리를 벗어나면 채소의 잘린 꼭지처럼 하찮게 버려지는 것 기억에 대한 마음의 기울기란 늘 그런 것이다 그 기울기만큼 경사진 언덕을 터덜터덜 걸어서 홍예문을 통과할 때 부두에 정박한 화물선 마스트 위로 도넛처럼 걸려있던 부윰한 오후의 해 내 발은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
('홍예문에서-익숙한 거리에서 기억을 줍다1' 중에서)
'문구용 칼로 새긴 문신'을 했던 '그 칼날 끝에 묻어나던 핏물처럼 선명한 10대'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유공원 입구 쪽으로 올라가는 시인이 보인다. '기억에 대한 마음의 기울기'만큼 '경사진 언덕'을 걸어 홍예문을 통과하던 시인은 그 '익숙한 거리에서 기억을 줍'고 있다.
시인의 모교인 제물포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홍예문은 인천 근대의 상징물이자 역사적 장소다. 지금은 낭만적인 연애 장소이자 관광지인 홍예문을 무지개문, 혈문이라고도 했다. 이 문은 일본인들의 조계지 확장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뚫었는데, 당시 조선인 노동자 50명이 돌무더기에 깔려 죽었다고 한다.
모든 장소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웅성거리며 모여있다. 장소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삶을 경험하고 존재를 확인하고 끝내 기억하는 곳이다. 시인은 문청 시절의 낭만적 감수성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데, 시에서 장소성과 장소감을 드러낼 때도 그런 특징이 드러난다.
이 시와 함께 같은 부제를 달고 있는 시 '신포동 백제호텔 커피숍-익숙한 거리에서 기억을 줍다2'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시인이 오래전 사랑을 잃어버린 곳이기도 하다. 자유공원을 등지고 홍예문 아래쪽에는 신포동이 있었고 그곳에 카페 시랑(詩廊)이 있었다.
시인은 20대 문청 시절 채성병 시인이 운영하던 카페 시랑(詩廊)에서 김윤식 시인과 낮에 자주 어울렸고, 밤이면 채성병·김윤식 시인을 따라 미미집, 백항아리집, 은성다방을 전전했다.
그때 그곳에서 김영승·조우성·정승렬·김학균·손설향 시인, 김양수·김재홍 문학평론가 등이 문학 이야기로 열꽃을 피웠고, 시인은 말석에 앉아 있었다.
시인이 자주 갔던 백제호텔 커피숍은 신포동에서도 조금 후미진 곳이었다. '커튼이 드리워진 창가 테이블 / 카운터를 등진 안쪽 / 첫 번째 의자였던', 시인이 끄적거리던 것은 완성하지 못한 연서(戀書)였을까.
시인은 '한때 세상을 바꾸려 했던', '바뀐 세상에서 비틀거'(그는 더 이상 진보적 잡지를 읽지 않는다)리는 '그'를 보았다. '생활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그', 생활은 '낯선 전선'이라던 '그'는 다름 아닌 시인 자신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뀐 세상은 고작 몇 년이었고, 다시 더 뒤집히고 기울어진 세상이 우리에게 도착했다. 그렇지만 다시 힘을 내야 한다. 시인이 병든 어머니를 위해 쓴 연작시의 부제 '힘내요 태인 씨'처럼 누구에게나 '힘내요 ○○씨!' 손을 내밀어, 이 대책 없이 추운 겨울을 함께 건너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