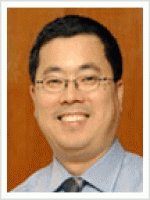1970년대 중반,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 자투리땅에 방공호(防空壕)가 만들어졌다. 대략 길이 2m, 폭 1m, 깊이 1m 정도로 네댓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 호를 파는 작업엔 대개 5~6학년 상급생들이 동원됐는데, 삽과 괭이는 집에서 가져와야 했다. 담임 선생님 감독을 받으며 수일 동안 틈틈이 급우들 전체가 구덩이를 팠다. 어쩌다 생각이 나면 조그만 고사리손으로 어떻게 맨땅을 그리도 깊이 팠는지 한숨이 나온다.
사이렌이 울리고 공습경보가 울리면 책을 덮고 교실을 나와 방공호로 뛰었다. 서너 명씩 조를 짜 미리 정해놓은 구덩이로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몸을 최대한 구부렸다. 어떤 날은 준비해온 비닐 막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이때는 훈련도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는데, 아마도 교육청이나 관청 관계자가 나왔던 날이 아닌가 싶다.
1983년 여름 어느 날 사이렌이 요란했다. 예정에 없던 공습경보가 발령됐는데, 여느 훈련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었다. 방송 아나운서는 흥분한 목소리로 연신 실제상황이라며 대피소를 찾아 최대한 빨리 몸을 숨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전국이 떠들썩했던 이웅평 상위(1954~2002) 귀순 사건이다. 김책공군대학을 나와 인민군 공군 비행사로 복무하던 이웅평이 전투기를 몰고 탈북하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올해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실시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통합방위협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2016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한다. 사이렌과 TV 자막 위주로 전파된 민방공 경보는 휴대전화 문자로도 전송해 즉각 대피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주행하던 차량이 멈추고, 행인들이 지하나 실내 도피처를 찾는 광경을 다시 보게 된 것이다.
회의에선 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상가단지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평시에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고 한다.
지난해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민방공 경보가 울렸으나 많은 주민이 이를 인식조차 못했다. 울릉도에선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주민들이 허둥댔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건 적군만이 아니다. 한반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도 빈번하다. 유비무환이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