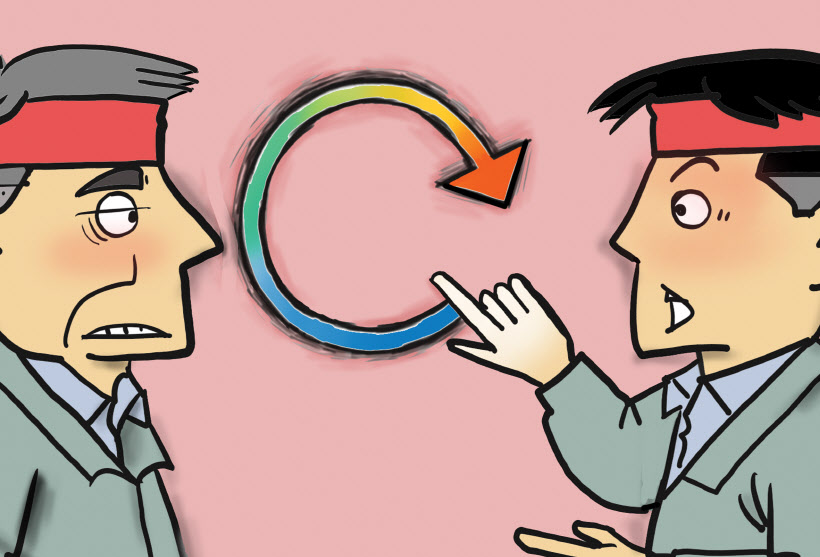
산업혁명 시기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악랄하게 착취했다. 중세의 봉건 영주와 중산층은 산업자본가로 변신했고 농노들은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 1905년 제정 러시아 도시 노동자 수십만명이 황제에게 임금 인상을 청원하는 행진을 벌이다가 총탄에 쓰러졌다. 러시아 혁명을 잉태한 '피의 일요일 사건'이다. 서구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단결을 모색했다. 노동조합 결성까지 오랜 세월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를 흘렸다.
순식간에 독립과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에선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제도에 매달려 시작됐다. 해방공간의 좌우익 노동운동 충돌을 거쳐 1948년 대한노동총연맹이 출범하고 1953년엔 근로기준법이 제정 시행됐다. 하지만 대한노총의 후신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현 한국노총)은 어용노조로 조롱받을 만큼 역할이 미미했고, 1970년 전태일 열사는 자신을 불살라 허울뿐인 근로기준법을 화형시켰다. 대한민국 노동운동 역사는 새로 시작됐다.
1980년대 한국노총과 결을 달리하는 노동단체 설립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전두환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시민세력이 호응했다. 1990년 출범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 전환된 뒤 복수노조 합법화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민주노총의 약진에 자극받은 한국노총도 투쟁력을 끌어올리며 양대 노총이 노동운동을 독점한 세월이 한 세대를 넘겼다. 두 노조는 각각 100만명이 넘는 조합원으로 노동현장의 권력이 됐다. 권력부패의 법칙엔 예외가 없는 것인가. 요즘 독과점 노조에 향한 정부의 비판이 거세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건설 노조 현장 비리와 부조리, 부실 회계 등 노조가 빌미를 줬다. 정부의 공세가 정치적일 수도 있으나, 노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것 또한 현실이다.
양대 노총에게는 정부보다 MZ세대의 이탈이 훨씬 뼈아프다. 청년 노동자들이 한노총, 민노총 투쟁 방식을 거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비정규직의 무차별적 정규직화에 반발하던 '인국공' 세대들이 전교조를 이탈하고, 양대 노총의 편파적인 정치파업과 불투명한 회계를 비판한다. 급기야 지난 21일엔 각 사업장의 MZ세대 노조원 6천여명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발족했다. 노동운동사에 지각변동이 감지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조합원 세대교체와 시대 변화에 눈 감아 자초한 결과이다.
/윤인수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