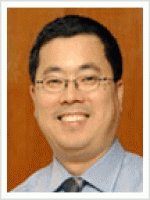죽산 조봉암(1899~1959)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해 제헌 국회의원과 2대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이승만 정권 당시 국가변란과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아, 1959년 처형됐다.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개혁과 경제체제의 틀을 닦았다.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죽산의 처형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구제,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대법원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친일 혐의로 독립유공자 서훈은 받지 못했다. 근거는 '인천 서경정 조봉암이 휼병금 150원을 냈다'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국방헌금 관련 기사. '조봉암'의 주소가 죽산 선생 주소나 연고지와 다른 등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보훈처는 인정하지 않았다.
동농(東農) 김가진(1846~1922)은 조선말 문신으로, 초대 주일공사를 지내고 갑오개혁에 참여한 외교관이자 정치인이다. 독립협회 창설에 참여했고, 대한협회장으로 한·일합방을 주장하는 일진회와 대립했다. 일본어와 중국어에 능하고 명석하며 한학에 정통했다. 서예로도 명성이 높은데, 독립문 현판도 그가 썼을 것이란 가설이다.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최익환 등과 제2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비밀조직 '대동단'을 결성해 총재로 추대됐다. 그해 10월 아들(김의한)과 상하이로 망명해 김좌진 장군 고문으로 활동했다. 아들과 며느리(정정화)는 독립 유공자 서훈을 받았으나 동농은 보류됐다. 남작 작위를 일제에 '공식적으로' 반납하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다.
정부가 문서 조작이나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저평가된 인사나 단체의 공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평가하기로 했다. 공적 심사는 2심제에서 3심제로 개편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독립유공자 선정을 두고 허위공적 논란에, 친일엔 엄격하고 친북엔 관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는 공적 가로채기 의혹을 받았다.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은 6차례 탈락하고도 문재인 정부 초기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가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참에 소모적 논쟁, 끝장내야 한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