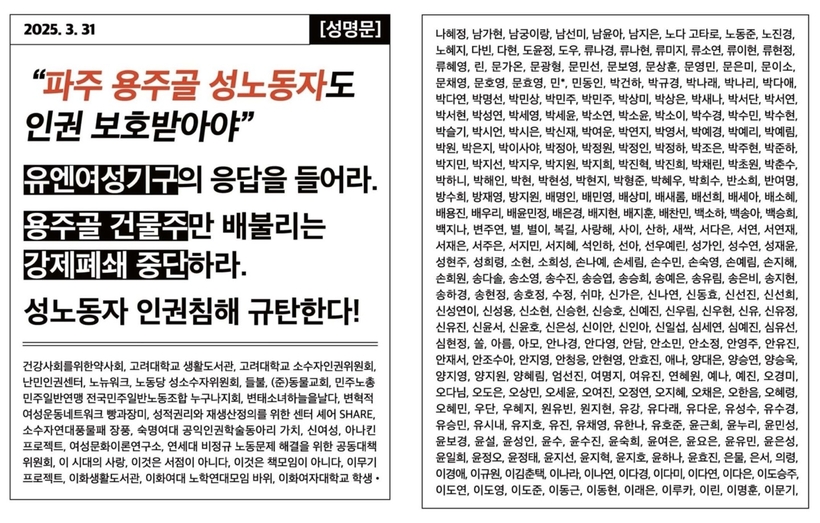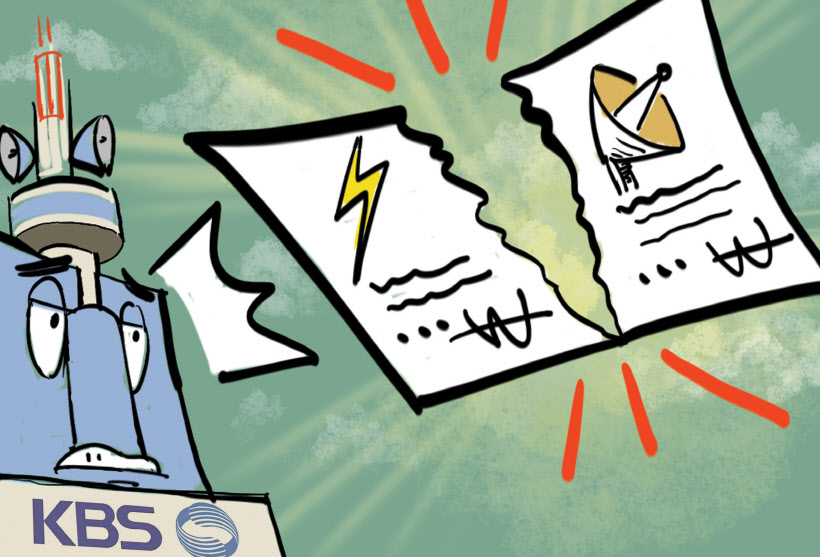
세계 각국의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수신료를 징수한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때문이다. 정부 예산과 기업 자본이 유입되면 공공의 이익을 수호할 공영방송의 공정과 독립이 무너진다. 수신료는 공공재인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표시이다. 수신료 분쟁은 신뢰의 붕괴를 의미한다.
KBS(EBS 포함)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국내 유일의 공영방송이다. 1963년 임시조치법으로 쇠고기 한근 값인 100원을 수신료로 받기 시작했다. 1972년 한국방송공사법으로 수신료 징수 제도가 확정됐고, 1981년 컬러TV 기준 수신료 2천500원이 지금도 그대로다. 1994년부터 한전의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면서 KBS는 막대한 수신료를 챙겼다.
KBS 수신료 수난사는 열거하기 힘들다. 전두환 정권 때는 '땡전뉴스'에 항의하는 국민들이 대대적인 시청료 거부운동을 벌였고, 반대로 김대중 정부 때는 우파 시민단체들이 수신료 거부 위헌소송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 때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진보진영이 결사 저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진보진영 언론과 시민단체가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였다.
공영방송 KBS가 정권교체가 거듭될수록 정권의 도구로 민심에 각인되면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역대 정부가 번갈아 앉힌 KBS 사장들이 한결 같이 시청료 인상을 호소하고 읍소했지만 국민적 거부로 좌절된 배경이다. 국민이 평가한 공영방송 KBS의 가치는 1981년 이후 40년 넘게 고정된 수신료 2천500원이다.
12일부터 전기요금과 KBS(EBS 포함)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됐다. 정부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앞세워 수신료 강제징수 반대 여론을 밀어붙였다. KBS 김의철 사장은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BS의 가장 큰 걱정은 수신료 수입 감소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전파탐지차량으로 수신료 미납 시청자를 색출해 고액의 벌금을 물린다. 공영의 자부심과 국민의 신뢰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KBS가 BBC처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재로 달려가기 보다 임직원 전체가 공영방송의 공정과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먼저지 싶다. 무보직 억대 연봉자 1천500명도 공영의 정의에 반한다. 공영의 가치를 회복해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과 만나면, 수신료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윤인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