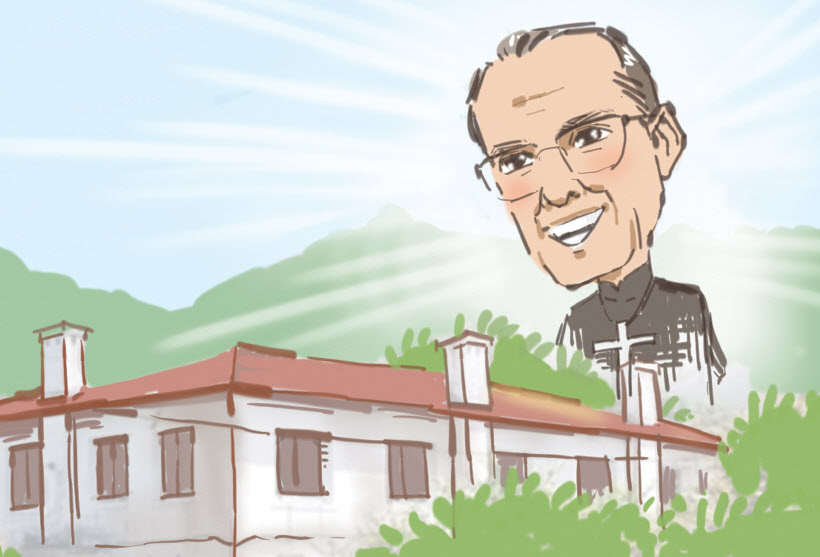
인천 앞바다의 섬 덕적도에 처음 발을 딛는 여행객은 '최분도'라는 이름부터 듣게 될지 모른다. 한 여행객은 섬이 예쁘다는 소릴 듣고 덕적도를 방문했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최분도 신부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문화해설사를 찾아 나선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1966년 4월의 어느날 벽안의 신부가 덕적도에 발을 디뎠다.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섬,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전등, 병원, 상수도, 가난…모두 급한 일입니다. 동족끼리 전쟁을 한 가난한 이들이 이곳 주민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어렵고 헐벗고 사는 게…게다가 아픈 이들이 많아요." 최분도(Benedict Zweber·1932~2001) 신부의 섬 생활은 이처럼 간절한 기도로 시작됐다.
그는 덕적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섬 개발에 나섰다. 먼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병원부터 세웠다. 이어 미군 쾌속정을 병원선으로 개조, 낙도를 순회하며 숱한 생명을 구했다. 병원선의 이름은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호칭 가운데 하나인 '바다의 별'이었다. 덕적도에 처음 전기를 끌어온 이도 최분도 신부다. 부산에 있는 미군레이더 기지에서 발전기를 구입, 섬에 전기를 공급한 그는 당시 직접 전주를 메고 800m의 산을 넘기도 했다. 지금도 덕적도에는 그때 만들어진 사각 모양의 전신주가 몇 개 남아있다. 서포1리 해수욕장 하천복개공사 때는 돌을 깨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어민소득증대사업에도 손을 대, 주민들에게 김 양식기술을 보급했다. 김 양식을 배우던 주민들이 해변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간첩으로 오인 받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섬 구석구석에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지금도 덕적도에는 1976년 최분도 신부가 1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섬을 떠나던 날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나를 이 섬의 한 주민으로 기억하고 기도해 달라"는 그의 말에 섬은 울음바다가 됐다고 한다. 그의 '한국 사랑'을 보여주듯 2001년 3월 미국 뉴욕 메리놀 신학대학에서 치러진 그의 장례미사에서는 '아리랑'이 울려퍼졌다.
최분도 신부를 기리는 역사기념관이 조성된다고 한다. 옹진군과 천주교 인천교구가 최분도 신부가 세운 '복자 유 베드로병원' 건물에 '덕적도 천주교 역사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서해 낙도의 슈바이처'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임성훈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