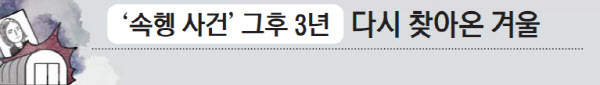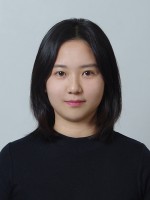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속헹 사건' 그후 3년 다시 찾아온 겨울·(上)] 비닐하우스와 농막이 전부인 이주노동자들
포천 농장, 패널 형태 임시 건물
창문도 막았지만 외풍 스며들어
2020년 사망사건에도 변화 없어
"정부 등 외면속 농장주 안 변해"

3년 전 겨울,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서른 한살 이주노동자 속헹이 자다가 숨졌다. 포천 지역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날이었다.
'속헹 사건' 이후 농촌 이주노동자의 주거 여건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경인일보는 어김없이 찾아올 겨울 한파를 앞두고, 경기도 내 농촌의 비닐하우스, 농막 등 '불법 가건물'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났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2, 제3의 속헹'의 비극을 막을 방안을 모색해 본다. → 편집자주
겨울비 내리던 지난 16일 오후 포천의 한 농장. 흰색 반투명 비닐하우스 사이에 자리한 검은색 차광막을 두른 비닐하우스 문을 열자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임시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네팔에서 온 키마(31·가명)씨 포함 4명의 이주노동자가 먹고 자는 곳이다. 이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꼬박 10시간을 상추·시금치 등 채소를 재배하며 보내지만, 일을 마쳐도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 비닐하우스가 일터이자 집이기 때문이다.
키마씨의 안내로 그의 방문을 열자 쿰쿰한 냄새가 훅 끼쳤다. 하나 있는 창문은 '뾱뾱이'(에어캡)와 검은색 천으로 둘러진 채 환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4명이 공동으로 쓰는 재래식 간이화장실은 불이 꺼진 채 악취가 진동했다. 그마저도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창고형 비닐하우스 1개동을 지나야 닿을 수 있었다.
냄새보다 더 큰 걱정은 추위다. 9.9㎡(3평) 남짓의 그의 방은 외풍이 패널 사이를 뚫고 끊임없이 스며들었다. 키마씨는 보일러 없는 방에서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하나만을 의지한 채 이번 겨울을 보내야 한다. 그는 "바람이 들어와 추워서 창문을 막았다"며 "겨울에는 이거(전기장판)에 딱 붙어 자야 하는데 어떻게 버틸지 벌써 두렵다"고 말했다.

한파경보가 내린 지난 2020년 12월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이 숨진 채 발견된 지 3년이 지난 올해 겨울, 경기도 내 농촌 이주노동자의 주거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속헹 사건 이후 여전히 같은 모습의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서 먹고 자는 이주노동자들은 한파가 몰아칠 이번 겨울을 어찌 살아낼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찾은 이천시의 한 비닐하우스. 썸밧(23·가명)씨가 본격적으로 찾아올 추위에 대비해 비닐하우스 정비 작업에 한창이었다. 캄보디아에서 온 그는 채소밭이 있는 해당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50m가량 떨어진 또 다른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다.
썸밧씨가 먹고 자는 공간은 비닐하우스 안의 10㎝ 두께 패널 조립식 건물로, 외형은 키마씨의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는 다른 이주노동자 3명과 각각 방을 쪼개 이곳에 살고 있다. 난방을 돌릴 수 있는 기름보일러가 갖춰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장이 잦다는 게 문제라고 한다.
썸밧씨는 "어젯밤에는 이불과 옷을 껴입었는데도 추워 사장에게 춥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토로했다. 썸밧씨는 이 같은 숙소와 먹을거리를 제공받는 대신, 농장주가 매달 45만원씩 월급에서 가져간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속헹 사건 이후 언론매체 등의 주목 등으로 부분적인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외면 속 여전히 대다수 농장주들은 비닐하우스 같이 불법적인 형태의 기숙사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제2, 제3의 속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수현·목은수·김지원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