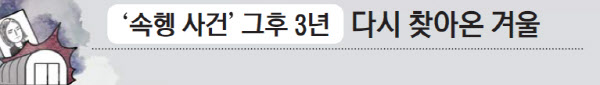['속헹 사건' 그후 3년 다시 찾아온 겨울·(下)] '이주노동자 비극' 되풀이 안되려면
사업주 동의 얻어야 직장 옮겨
지난달부터 권역별 '지역 제한'
道 5곳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
불법 만연 생활여건 개선 주목
비닐하우스와 농막 같은 불법 가건물에서 이주노동자가 추위로 죽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가로막는 등 운신 폭을 제한해온 고용허가제의 손질이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와 도내 5개 시·군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 공공기숙사' 사업이 주거 여건 개선에 한몫 할지도 관심사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지난 2004년 시행된 제도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이를 통해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받아 국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는 내국인 노동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만 18~40세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알선해주고 이 제도로 들어온 노동자의 국내 체류 기간은 최장 4년10개월이다. 정부는 올해 12만명이던 고용 한도를 늘려 내년 16만5천명(농업분야 1만6천명)까지 받기로 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에서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단서 조항은 줄곧 사용자와 노동자 간 차별적 위계를 설정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 제도를 통해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며 횟수는 체류기간 내 3회로 제한된다.
여기에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수도권, 충청, 전라권 등으로 권역을 나눠 첫 직장 지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과 처우 등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감은 더 커진 실정이다.
'속헹 사건' 이후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건물에서 거주 중인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지만, '권역 내 이동제한' 등에 얽히게 된 노동자들이 과거보다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은 "내국인과 달리 이주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아직도 제한하고 있는 건 차별적인 동시에 노동자가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사업장 변경 권리와 체류기간 제한을 푸는 변화가 늦었지만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와 일을 시작한 지 1년가량 지난 시점에 사업장 변경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의 절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5개 시군(포천, 안성, 양주, 파주, 연천)과 함께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이 불법 가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에 물꼬를 틔울지 주목된다.
도는 구체적으로 지난 3월 만든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 등 대상 공공기숙사를 5개 시군 각각 1곳씩 총 63억여원(도비 27억원 포함)을 들여 건립하기로 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기도 지역을 짚어 사업을 펼치는 것에서 시사하는 점이 있다"며 "중앙정부가 주거뿐 아니라 노동 관련 교육 등이 집합된 거점형 시설을 만들어야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수현·김지원·목은수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