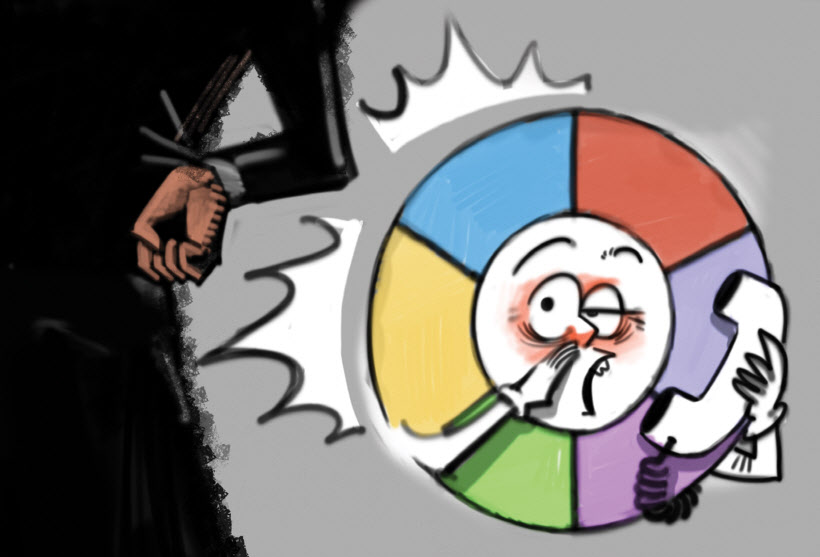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 여론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은 물론 조사 기간, 문항 설계, 질문 방식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인구 구성, 연령대 비율에 따라 ARS(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와 CATI(전화면접조사) 결과는 천양지차다. 여론조사가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는 방증이다. 오죽하면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라는 말이 있겠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전국 등록업체 88개 가운데 3곳 중 1곳이 문을 닫고, 53곳만 남게 됐다. 그래도 일본 20곳, 프랑스 13곳보다 많은 숫자다. 선거철에 등장했다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체'가 정리되는 점은 바람직하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적발된 여론조사 불법 사례는 각양각색 교묘하다. 특정 후보 지지를 강조하거나, 정당 이름을 되물으며 유도하기도 한다. 또 결과의 왜곡과 조작은 물론 임의로 작성한 후보자 지지도를 선거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도록 둔갑시켜 SNS에 게시한 사례도 있다.
선거 여론조사 역사를 보면, 치명적인 실수가 많았다. 1936년 미국 대선 때 대중잡지 리터러시 다이제스트가 대표적인 예다. 공화당 알프레드 랜던의 당선을 예측했으나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승리했고, 공신력이 바닥을 쳐 결국 2년 뒤 폐간됐다. 2016년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클린턴 힐러리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를 누르고 당선될 것이라는 결과가 다수였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대반전이었다. 두 사례 모두 조사대상 표본추출에 실패했다.
유권자는 차선이냐 차악이냐를 선택해야 할 때 여론조사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가 아닌 소수 표본 대상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가 없다.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유권자를 생각하면 조사업체의 도덕성은 더욱 무거워야 한다. 선관위의 솎아내기에도 살아남은 업체들은 정파적 목적 혹은 후보자 요구에 기본 윤리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공정성의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여론조사가 양식과 양심에서 벗어나면 국민이 흔들리고 나라가 망가진다.
/강희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