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못생기지도 가난치도 않은 나
현재 돌아보니 크게 안 바뀌었지만
병속 편지처럼 다가온 그때 무지개
오늘 내 스스로에게 기분 북돋아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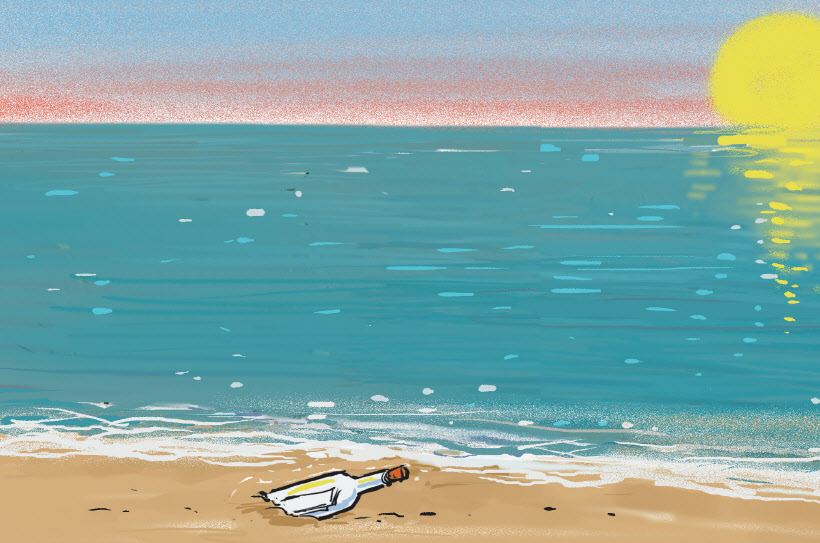

도서관이 문을 닫으니 카페로 가는데 모처럼 집중이 잘 된 날의 풍경을 묘사해보면 이렇다. 오후 내내 똠양꿍과 같이 뜨겁고 맵고 시고 짜고 달콤한 수프를 끓여대고 있다고.
물론 가상의 수프다. 정확히 해두자면 두뇌 전골수프라고 할까, 우선 이 요리를 끓이는 냄비는 내 두개골이다. 소재랄 수 있는 새우나 고기는 이미 있지만 그것 만으로 찌개가 끓여질 리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자극을 줄 것들을 열심히 집어넣는다. 일단 '부팅용 독서'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양한 책을 펼쳐 서퍼가 파도를 가르듯 아무렇게나 읽기 시작한다. 그러다 줄을 쳐 놓은 책 속의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으며, 말과 개념을 횡단하는 것으로 일상의 리듬을 작업의 리듬으로 바꿔나간다.
이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캐낸 문장을 노트에 휘감고 있으면 노트는 금속으로 된 원통으로 변하고, 코일들이 감기면서 자기력을 띨 때까지 회전하며 일종의 자력을 만드는 것이다. 자력이 생긴다면 철가루와 같은 금속들이 달라붙어 이야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원만하게 돌아갈 리가 없다. 정신 차려보면 웹의 바다에 휩쓸려 시간을 잔뜩 허비한 나를 발견한다. 한탄하는 일기를 적으려고 파일을 열다가, 실수로 서른두 살 때의 일기를 클릭했다. '어쩌면 내가 가장 잘하는 짓은 한심하게 시간을 보낸 후 신랄한 말로 자신을 질책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오려서 붙여도 다를 바 없는 자책이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느닷없는 자기진단이 이어진다. '나는 아주 못생기지도, 아주 가난하지도 않다. 사고무친 고아라거나 원수 같은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성격마저 낙천적이다. 나 같은 타입은 살아가긴 좋아도 작가가 되기에는 생긴 꼴이 틀려먹은 것이 아닐까'. 그때는 정말 돈 한 푼 없던 백수시절인데, 가난하지 않다고 해서 놀랐다. 외양도 마찬가지다. 나 자신을 후하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그 때문에 '작가가 되기에는 틀려먹은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으니 너무 웃겼다. 소설은 열심히 쓰지 않으면서 반성문은 열심히 쓰고, 거기에 '원단' 타령을 하는 내가 새삼 돋보였다고 할까. 그 시절 진정한 습작은 작가들을 흉내내다 미완성으로 끝난 소설이 아니라 어쩌면 이 반성문에 있는지도 모른다.
잠시 후 기성작가의 책 몇 권을 읽더니 곧장 비판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인간이 별스러운 세계를 건너가려고 하면 죄다 징징대야 하는 건가?' 맞다. 그 시절의 내가 읽던 책이 아마 지금의 내가 쓰고 있는 책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징징거리고 있다! 과거의 일기를 미래에 와서 읽어보니 그야말로 웃기고 슬프다. 바뀌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데, 바뀐 것이라고는 조금 비관적인 성향의 작가가 된 것일 뿐.
'희망과 시무룩의 쌍곡선'. 오래전의 나는 내 상태를 이렇게 적었다. 병 속의 편지처럼 떠내려온 그 시절의 무지개가 오늘 내 기분을 북돋아 주었다. 여전히 나는 그 곡선의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 채로 작가가 되어 십여 년을 또 지내왔으니 코앞의 마감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정말 비밀인데, 아직까지 이야기는 끊임없이 밀려나온다. 아침에 일어나 전날 써 둔 프린트를 보면 행간 사이에 또다시 수북이 자라있는 이야기의 덤불을 발견한다. 굉장한 작가가 아니어도 '작'을 할 수 있게 되면 '쓸 것'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쓸 상태'를 얻지 못해서 이야기를 전진시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투명한 상태에 놓인 이 아이디어들에 문장을 입혀 제대로 자리 잡게 해주는 것이 오늘의 과제. 원통에 코일을 감고, 자기력을 돌려야 할 때다.
/김성중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