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문학·그림 등 인문학 요소 서술
정진오 작가 "인류역사 最古 금속업
첨단 기술 원형질이자 기술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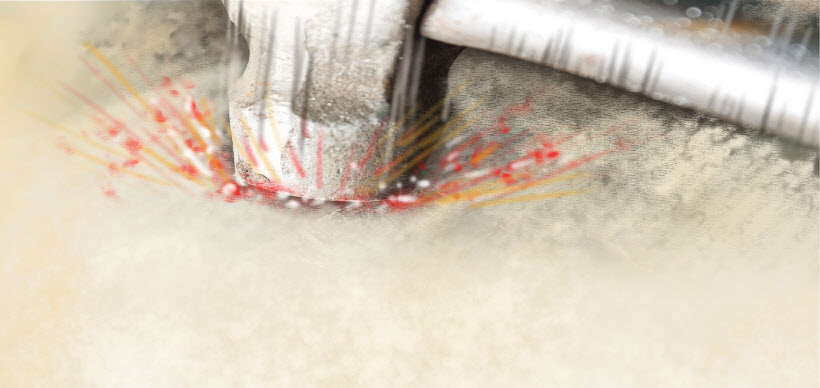
■ 대장간 이야기┃정진오 지음. 교유서가 펴냄. 296쪽. 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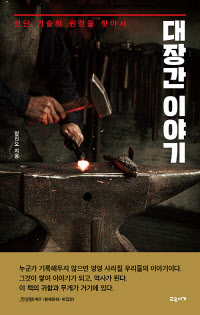
정진오 작가의 '대장간 이야기'는 도원동 대장간 골목의 맏형이자 최고령 대장장이인 1938년생 송종화 장인의 하루로 시작한다.
'85세 대장장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화로에서는 지름 5센티가 넘는 굵은 쇠막대기가 누런 색깔로 달구어졌다. 대장장이는 커다란 집게로 그 쇠막대기의 끝을 잡고 바로 옆에 놓인 기계(스프링 해머) 쪽으로 가져갔다. (중략) 땅~땅~땅~땅~. 대장장이는 양손으로 쥔 쇠막대기를 해머가 고르게 때릴 수 있도록 좌우로 돌리기도 하고, 밀었다 당겼다 하기도 했다.'(24쪽)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지는 70년 경력 대장장이의 일상은 쉴 틈이 없어 보인다. 각종 공장에서 공산품으로 나오진 않는 이것저것을 주문하고, 건설 현장에서 쓰는 연장을 부탁받기도 한다. 어구, 농기구, 엿장수의 '악기' 엿가위까지 지역마다 모양새와 쓰임새가 다른 도구들을 척척 만들어 낸다. 이곳 대장간이 아니면 어디서도 만들지 못할 것들이다.
조선 최고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의 '대장간' 그림에선 대장, 메질꾼, 풀무꾼 등 4~5명이 달려들었던 공정을 이젠 노령의 대장장이 한 명이 도맡고 있다.
특히 네모난 자동차 판스프링을 불에 달구고 두드려 만드는 엿가위는 송종화 장인의 것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한다. 적당한 온도로 달궈내 숙련된 망치질이 더해져야 한다. "가위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려면 쇠를 잘 때려서 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송 장인의 망치질은 마치 악기 연주처럼 흥겹게 들렸다고 저자는 기록했다.
현장에서 시작한 '대장간 이야기'는 신화, 문학, 역사, 그림, 영화, 음악, 지명 등 온갖 인문학 요소를 대장간이란 화로에 녹여내고, 그것을 두드려 펴서 정밀한 이야기로 세공했다. 작가는 대장장이를 제자로 맞은 퇴계 이황, 대장간을 운영해 식솔을 먹여 살린 율곡 이이를 통해 철학분야까지 대장간 안으로 들였다. 백범 김구가 인천감리서에서 탈출할 때 쓴 '삼릉창'이나 이순신 장군이 만든 '조총' 이야기도 흥미롭다.

농업, 맨손어업, 무속 같은 전통 영역은 대장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강화도에서 쓰는 호미와 황해도 옹진에서 쓰는 호미, 과거 인천에서 밭농사를 많이 지었던 화교들이 쓰는 호미가 다르다. 이들을 모두 만들 줄 아는 대장장이가 1945년생 영흥민속대장간 이규산 장인이다.
이규산 장인은 화재로 소실됐던 국보 1호 숭례문 복구 현장을 지킨 대장장이다. 과거 전국의 대장간 없는 마을을 떠돌던 '이동식 대장간'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대장간에서 만드는 각종 철물뿐만 아니라 대장장이가 쓰는 화로, 모루, 수십 가지 망치와 집게 등 도구 자체가 박물관에서 전시해야 할 만큼 희귀해진 시대다. 그 사라져 가는 현장을 쓰고 사진에 담은 정진오 작가는 지난 20일 '대장간 이야기' 출판기념행사에서 이규산 장인에게 책을 헌정했다. 대장장이에게 책을 헌정한 이유는 작가의 글에서 가늠할 수 있다.
'그들의 일터인 대장간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금속 소재 산업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그 대장간은 생동하는 기술 박물관이다. 그곳에 첨단 기술 산업의 원형질이 숨쉬고 있다.'(7쪽)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