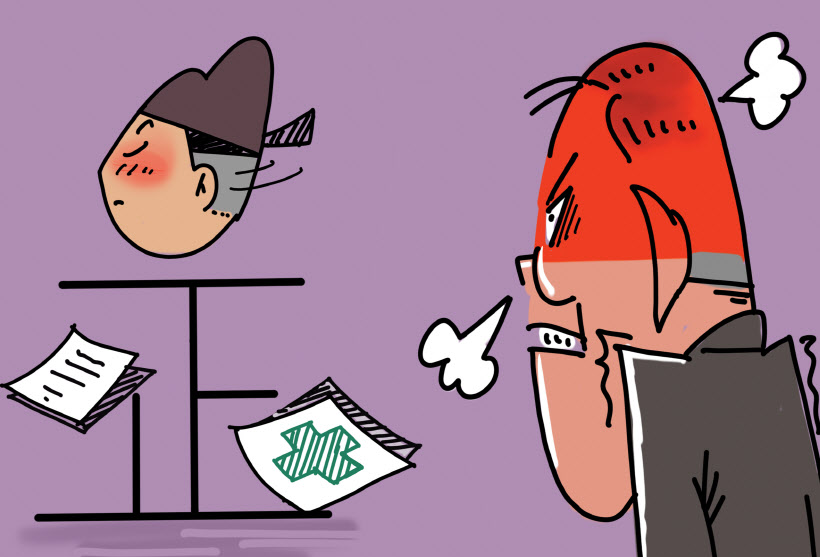
'주역'은 점서(占書)다. 문왕과 주공에 의해서 완성된 주나라 역임에도 당당히 사서삼경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어', '맹자'와 함께 유교의 최고 경전으로 꼽힌다. 사서에 들어가 있는 '대학'과 '중용'도 본래 '예기'의 일부분이었으나 이를 독립시켜 주자가 사서로 삼았다. 주자에 이르러 지금의 사서삼경의 체계가 완비됐다.
유교에서는 '경'과 '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바, '경'은 공자의 말을 증자가 기술한 것이고, '전'은 증자의 말을 증자의 제자들이 정리한 것이다. 이 사서삼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익히는 책이 바로 '주역'이다. 그만큼 '주역'은 공부하기가 난해할 뿐 아니라 우주 변화의 원리와 인생의 묘리를 담고 있어 그 깊이를 알기 어렵다.
'주역'의 57번째 괘인 중풍손(重風巽)의 효사 중에 '정호흉야'란 말이 있다. '바른데 흉하다'하는 뜻이다.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은 좋은 것이고, 정당한 것이며, 언제나 추구하고 따라야 할 가치다. 그런데 '주역'은 이를 흉하다고 말한다. '주역'의 묘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리 바르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지나치거나 "고정된 가치관에 복속되면 흉운이 된다('도올 주역 강해')"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이다.
역사상의 위대한 성인들과 혁명가들 그리고 개혁가들도 '정호흉야'를 피할 수 없었다. 인류 구원의 새 장을 연 예수를 비롯해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러했다. 또 혁명가 체 게바라, 명나라의 재상 장거정·정암 조광조·김옥균·고 노무현 대통령 등 개혁가들의 운명이 다 그러했다. 장거정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목종과 신종을 보필하며 각종 개혁을 단행했다.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로 생긴 국가재정 위기를 해결하려고 장거정은 토지조사를 통해 황실·외척·지주·관료들 소유의 토지 불법적 겸병을 막고 잡다한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시행했다. 개혁은 성공했으나 장거정 사후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개혁은 다 허사가 되고, 그는 부관참시 되는 흉을 당했다.
특검 같은 국회 입법이든 의대 증원 같은 정부 정책이든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고 해도 절차의 민주성과 사회적 동의를 받기 위한 소통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정(正)이 흉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